서브메뉴
검색
본문
Powered by NAVER OpenAP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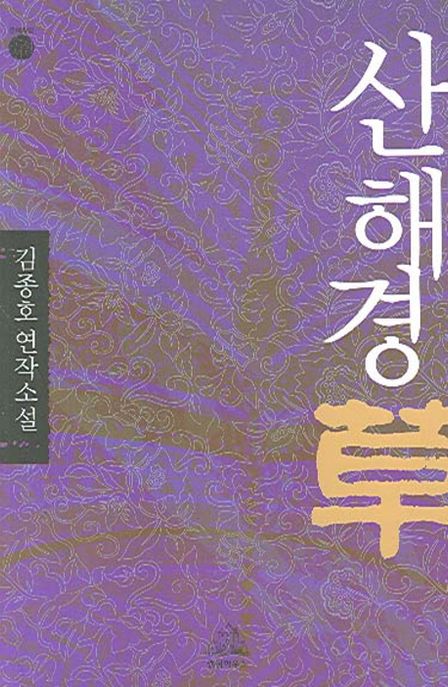
-
산해경草
저자 : 김종호
출판사 : 랜덤하우스코리아(랜덤하우스중앙)
출판년 : 2006
ISBN : 9788925503172
책소개
소설가 김종호의 연작소설. 첫 소설집『검은 소설이 보내다』를 통해 김종호는 형이상학적 사변과 장대한 신화적 상상력, 한없는 의미의 지연과 서사적 구조의 완결성을 스스로 거부하는 듯한 스타일로 자신만의 문학상(狀)을 제시했다. 그의 소설은 우리가 익히 보아온 다른 어떤 소설보다 독특했으며, ‘충격의 미학’을 구성하는 현대의 낯선 소설적 전통 속에 위치해 있다. 이번에 출간된 『산해경草』역시 그가 지향하는 문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글 쓰는 행위를 통해 문학(소설)의 또 다른 정체성과 언어의 다른 영역, 세계-...
[예스24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나는 쓴다, 고로 존재한다!
소설가 김종호의 연작소설『산해경草』가 출간되었다. 첫 소설집『검은 소설이 보내다』를 통해 김종호는 형이상학적 사변과 장대한 신화적 상상력, 한없는 의미의 지연과 서사적 구조의 완결성을 스스로 거부하는 듯한 스타일로 자신만의 문학상(狀)을 제시했다. 그의 소설은 우리가 익히 보아온 다른 어떤 소설보다 독특했으며, ‘충격의 미학’을 구성하는 현대의 낯선 소설적 전통 속에 위치해 있다. 이번에 출간된 『산해경草』역시 그가 지향하는 문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글 쓰는 행위를 통해 문학(소설)의 또 다른 정체성과 언어의 다른 영역, 세계-바깥의 언어 너머의 빛을 끊임없이 발견, 탐구하고 있다.
『산해경초(草)』는 ‘다른’ 방식의 소설이다. 따라서 그것을 읽으며 어떤 구체화된 형상이 떠오르길 기대하면 곧 실망하게 된다. 거기에 확고하게 고정된 존재란 없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서산’ ‘남산’ ‘북산’ 등의 이름들마저 뚜렷하게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골방에 틀어박혀 글을 쓰는 ‘나’의 실체도 모호하다. 다만 그것이 느껴질 뿐 ‘나’의 모습이 어떠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해독의 코드를 잘 잡지 못하면 이 소설은 수수께끼가 되고 만다. 아니,『산해경草』를 읽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세계의 수많게 복수 지어진 이미지를 따라 읽다보면 김종호가 제시한 광활한 형이상학적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범우주적인 관점에서 문학의 광원(光源)이나 암원(暗原)을 찾아가는 새롭고 낯선 세계를 우리는 『산해경草』를 통해 목도하게 될 것이다.
소설의 첫 머리는 글을 쓰는 어떤 화자 ‘나’의 얘기로 시작한다. ‘나’는 ‘너-그녀’가 떠나가자 그 상실감을 메우려 글을 쓴다. 글을 씀으로써 그녀와 다시 만날 방법을 모색하지만 글을 쓰는 도중에 자유로운 상상력의 세계에 빠져들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체험하며, 예전에 없던 몸의 변화도 생겨나게 된다. 또한 쓰는 행위를 통해 ‘그것’을 발견하고, 애벌레에서 고치로, 그리고 나비로 변모할 수 있게 된다. 글 쓰는 행위를 체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환각의 세계를 맛보는 ‘나’는 ‘그것’을 끊임없이 느끼며 관찰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소설 전체의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것’은 소설을 이끌어간다. ‘그것’은 때때로 단순히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것’이다. ‘그것’은 때때로 몸 전체가 ‘눈’이 되거나 ‘아가리’가 되기도 한다. 때때로 무서운 괴물처럼 보이지만 어느 땐 작고 친숙한 동물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게다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과 동물의 모습도 괴이해지지만 무엇보다도 선충으로 묘사되는 문자 혹은 언어들이 바글거리는 모습에 ‘나’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 세계-바깥 혹은 너-그녀의 세계일 수도 있다. 그곳은 늘 비어 있지만 어딘가에 있고, 내 가까이 있으면서 갈 수 없는 곳이다. 과연 ‘나’는 의식이 내준 길을 따라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산해경草』가 주는 간략한 서사의 의미는 ‘너-그녀’를 찾다가 언어의 다른 영역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씀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존재하고, 텍스트 속에 갇혀있는 ‘나’가 아닌 자유롭게 사고하고, ‘서산’ ‘남산’ ‘북산’ 등 시?공간을 넘나들며 주체적 행위자로써 ‘그것’에 기인한 ‘그곳’이 소설 안에 존재한다. 그것이 문학의 윤리 혹은 음란함과 불순함에 관련되어지면서 소설은 또 다른 정체성을 요구한다.
김종호는 “차라리 문학의 윤리는 불순하고 음란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세계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세계와 결별할 때만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구조를 벗어나야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어설픈 화해는 부도덕하고 한번 구조를 벗어났으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한다. 여기『산해경草』는 의미도 아니고 형상도 아닌 기호들이 흘러내린 사유의 장(場)이다. 의미와 형상은 사라지고 ‘자서’는 텅 비어있다. 그러나 그 문자들로 이뤄진 세계-바깥의, 언어 너머의 빛을 보는, 오랜 침묵을 견뎌낸 언어 속에서 문득 열리는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미지의 장(場)이 되기도 한다.
소설가 김종호의 연작소설『산해경草』가 출간되었다. 첫 소설집『검은 소설이 보내다』를 통해 김종호는 형이상학적 사변과 장대한 신화적 상상력, 한없는 의미의 지연과 서사적 구조의 완결성을 스스로 거부하는 듯한 스타일로 자신만의 문학상(狀)을 제시했다. 그의 소설은 우리가 익히 보아온 다른 어떤 소설보다 독특했으며, ‘충격의 미학’을 구성하는 현대의 낯선 소설적 전통 속에 위치해 있다. 이번에 출간된 『산해경草』역시 그가 지향하는 문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글 쓰는 행위를 통해 문학(소설)의 또 다른 정체성과 언어의 다른 영역, 세계-바깥의 언어 너머의 빛을 끊임없이 발견, 탐구하고 있다.
『산해경초(草)』는 ‘다른’ 방식의 소설이다. 따라서 그것을 읽으며 어떤 구체화된 형상이 떠오르길 기대하면 곧 실망하게 된다. 거기에 확고하게 고정된 존재란 없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서산’ ‘남산’ ‘북산’ 등의 이름들마저 뚜렷하게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골방에 틀어박혀 글을 쓰는 ‘나’의 실체도 모호하다. 다만 그것이 느껴질 뿐 ‘나’의 모습이 어떠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해독의 코드를 잘 잡지 못하면 이 소설은 수수께끼가 되고 만다. 아니,『산해경草』를 읽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세계의 수많게 복수 지어진 이미지를 따라 읽다보면 김종호가 제시한 광활한 형이상학적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범우주적인 관점에서 문학의 광원(光源)이나 암원(暗原)을 찾아가는 새롭고 낯선 세계를 우리는 『산해경草』를 통해 목도하게 될 것이다.
소설의 첫 머리는 글을 쓰는 어떤 화자 ‘나’의 얘기로 시작한다. ‘나’는 ‘너-그녀’가 떠나가자 그 상실감을 메우려 글을 쓴다. 글을 씀으로써 그녀와 다시 만날 방법을 모색하지만 글을 쓰는 도중에 자유로운 상상력의 세계에 빠져들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체험하며, 예전에 없던 몸의 변화도 생겨나게 된다. 또한 쓰는 행위를 통해 ‘그것’을 발견하고, 애벌레에서 고치로, 그리고 나비로 변모할 수 있게 된다. 글 쓰는 행위를 체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환각의 세계를 맛보는 ‘나’는 ‘그것’을 끊임없이 느끼며 관찰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소설 전체의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것’은 소설을 이끌어간다. ‘그것’은 때때로 단순히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것’이다. ‘그것’은 때때로 몸 전체가 ‘눈’이 되거나 ‘아가리’가 되기도 한다. 때때로 무서운 괴물처럼 보이지만 어느 땐 작고 친숙한 동물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게다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과 동물의 모습도 괴이해지지만 무엇보다도 선충으로 묘사되는 문자 혹은 언어들이 바글거리는 모습에 ‘나’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 세계-바깥 혹은 너-그녀의 세계일 수도 있다. 그곳은 늘 비어 있지만 어딘가에 있고, 내 가까이 있으면서 갈 수 없는 곳이다. 과연 ‘나’는 의식이 내준 길을 따라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산해경草』가 주는 간략한 서사의 의미는 ‘너-그녀’를 찾다가 언어의 다른 영역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씀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존재하고, 텍스트 속에 갇혀있는 ‘나’가 아닌 자유롭게 사고하고, ‘서산’ ‘남산’ ‘북산’ 등 시?공간을 넘나들며 주체적 행위자로써 ‘그것’에 기인한 ‘그곳’이 소설 안에 존재한다. 그것이 문학의 윤리 혹은 음란함과 불순함에 관련되어지면서 소설은 또 다른 정체성을 요구한다.
김종호는 “차라리 문학의 윤리는 불순하고 음란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세계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세계와 결별할 때만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구조를 벗어나야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어설픈 화해는 부도덕하고 한번 구조를 벗어났으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한다. 여기『산해경草』는 의미도 아니고 형상도 아닌 기호들이 흘러내린 사유의 장(場)이다. 의미와 형상은 사라지고 ‘자서’는 텅 비어있다. 그러나 그 문자들로 이뤄진 세계-바깥의, 언어 너머의 빛을 보는, 오랜 침묵을 견뎌낸 언어 속에서 문득 열리는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미지의 장(場)이 되기도 한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그것
그곳
그 몸
그 말
남산경:暗源
서산경:연인=x
북산경:동물들
동산경:벌레-문자들
중산경:fuscum subnigrum
음란함의 게스투스:어느 것이 문학인가?
해설 - 언어 너머의 빛 / 김인호
그곳
그 몸
그 말
남산경:暗源
서산경:연인=x
북산경:동물들
동산경:벌레-문자들
중산경:fuscum subnigrum
음란함의 게스투스:어느 것이 문학인가?
해설 - 언어 너머의 빛 / 김인호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