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검색
본문
Powered by NAVER OpenAP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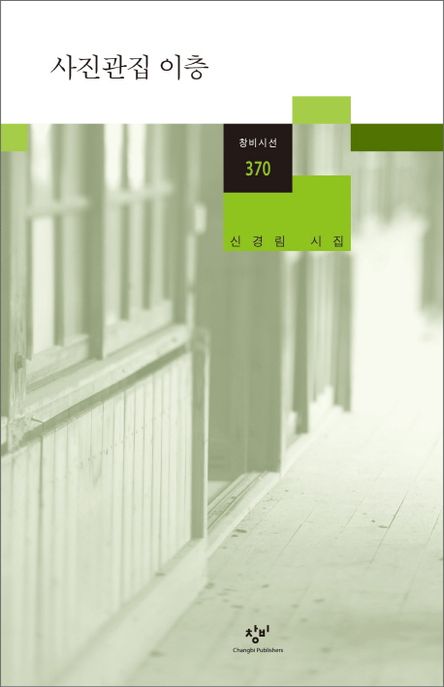
-
사진관집 이층 (신경림 시집)
저자 : 신경림
출판사 : 창비
출판년 : 2014
ISBN : 9788936423704
책소개
탁한 하늘의 별빛 같은 노래
기교 없이도 묵직하고 가슴 저릿한 대가의 시편들
문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곧은 ‘원로’로서 익숙하고 친근한 이름 석자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뚝 서 있는 신경림 시인이 신작 시집 [사진관집 이층]을 펴냈다. 시인의 열한번째 신작 시집이자 [낙타] 이후 6년 만에 펴내는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한평생 가난한 삶들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들을 고졸하게 읊조리며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건네는 맑고 순수하고 단순한 시편들을 선보이며, 지나온 한평생을 곱씹으며 낮고 편안한 서정적 어조로 삶의 지혜와 철학을 들려준다.
올해 팔순을 맞는 시인은 연륜 속에 스며든 삶에 대한 통찰과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시편들이 묵직한 울림 속에 잔잔한 여운을 남기며 가슴 저릿한 전율과 감동을 자아낸다. 등단 59년차에 접어든 시력(詩歷)의 무게와 깊이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서러운 행복과 애잔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시집이다.
목차
탁한 하늘의 별빛 같은 노래
기교 없이도 묵직하고 가슴 저릿한 대가의 시편들
문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곧은 ‘원로’로서 익숙하고 친근한 이름 석자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뚝 서 있는 신경림 시인이 신작 시집 "사진관집 이층"을 펴냈다. 시인의 열한번째 신작 시집이자 "낙타"(창비 2008) 이후 6년 만에 펴내는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한평생 가난한 삶들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들을 고졸하게 읊조리며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건네는 “맑고 순수하고 단순한 시편들”(이경철 ?발문?)을 선보이며, 지나온 한평생을 곱씹으며 낮고 편안한 서정적 어조로 삶의 지혜와 철학을 들려준다. 올해 팔순을 맞는 시인은 연륜 속에 스며든 삶에 대한 통찰과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시편들이 묵직한 울림 속에 잔잔한 여운을 남기며 가슴 저릿한 전율과 감동을 자아낸다. 등단 59년차에 접어든 시력(詩歷)의 무게와 깊이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서러운 행복과 애잔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시집”(박성우, 추천사)이다.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 별이 보인다/반짝반짝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하늘에 별이 보이니/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니/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반짝반짝 탁한 하늘에 별이 보인다/눈 밝아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별? 전문)
한평생 시의 외길을 걸어온 시인은 이제 황혼의 고갯마루에 이르러 “지금도 꿈속에서 찾아가는, 어쩌다 그리워서 찾아가는”(?나의 마흔, 봄?) 지난날을 돌이키며 빛바랜 추억의 흑백사진 속으로 걸어들어가 그리운 얼굴들을 현재의 삶 속에 되살려낸다. “서른해 동안 서울 살면서” 집에서 시장까지의 짧은 길만 오가며 사셨지만 “아름다운 것,/신기한 것 지천으로 보았을” 어머니(?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 “죽어서도 떠나지 못할” 산동네에서 살다 돌아가셨지만 시인의 마음속에는 그곳에서 “지금도 살고 계신” 아버지와 “아들도 몰라보고 어데서 온 누구냐고 시도 때도 없이 물어쌓”던 “망령 난” 할머니(?안양시 비산동 498의 43?), 그리고 “부엌이 따로 없는” 무허가촌 사글셋방에서의 가난한 삶 속에서 일찍이 사별한 아내. 그들은 이제 모두 떠나고 “세상은 바뀌고 바뀌고 또 바뀌었”지만 시인은 여전히 꿈인 듯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아득한 그리움에 젖는다.
떠나온 지 마흔해가 넘었어도/나는 지금도 산비알 무허가촌에 산다/수돗물을 받으러 새벽 비탈길을 종종걸음 치는/가난한 아내와 함께 부엌이 따로 없는 사글셋방에 산다/(…)/전기도 없이 흐린 촛불 밑에서/동네 봉제공장에서 얻어온 옷가지에 단추를 다는/가난한 아내의 기침 소리 속에 산다/도시락을 싸며 가난한 자기보다 더 가난한 내가 불쌍해/눈에 그렁그렁 고인 아내의 눈물과 더불어 산다//세상은 바뀌고 바뀌고 또 바뀌었는데도/어쩌면 꿈만 아니고 생시에도/번지가 없어 마을 사람들이 멋대로 붙인/서대문구 홍은동 산 일번지/떠나온 지 마흔해가 넘었어도/가난한 아내와 아내보다 더 가난한 나는/지금도 이 번지에 산다(?가난한 아내와 아내보다 더 가난한 나는? 부분)
세상은 바뀌었지만, 돌아다보면 지나온 길이 그립고 아름답게 빛난다
어머니와 달리 “어려서부터 집에 붙어 있지 못하고”(?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 늘 떠돌았던 시인은 낯익고 익숙한 것들 속에서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역전 사진관집 이층?)을 찾듯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고 찾으려고 하루하루 “활기차게” 살아간다. “아주 먼 데./말도 통하지 않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그 먼 데까지 가자고” 멀리 떠나기도 하지만 종내는 “사람 사는 곳/어디인들 크게 다르”지 않고 “아내 닮은 사람과 사랑을 하고/자식 닮은 사람들과 아웅다웅 싸우면서”(?먼 데, 그 먼 데를 향하여?) 살아가는 모습은 한결같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별들이 쌔근쌔근 코 고는 소리까지 들릴” 듯한 초원의 적막 속에서 문득 “세상의 소음”(?초원?)이 그리워진 시인은 “너무 오래 혼자”서 “차를 타고 달려온 길을/터벅터벅 걸어서/보지 못한 꽃도 구경하고/듣지 못한 새소리도 들으면서” “이쯤에서 돌아”(?이쯤에서?)가고자 한다.
어느새 서른해가 훨씬 넘었다/정릉에 들어와 산 지가/(…)/눈에 익지 않은 거리가 없고/길들지 않은 골목이 없다/그런데도 나는 매일 아침/이 골목 저 거리를 훑고 다닌다/어제까지 못 보던 것 새로 볼 것 같아서/밤이면 깨닫지만/아무것도 새로 본 게 없구나//아침이면 다시/활기차게 집을 나온다/입때까지 못 보던 것 무언가/어제 보았다고 생각하면서/그게 무언지 오늘/찾아야겠다 생각하면서/정릉에서 서른해를 넘게 살면서(?정릉에서 서른해를? 부분)
자연의 순리대로 세월은 가고 시인은 나이가 들었다. 시인은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웠다”(?다시 느티나무가?)고 말한다. 그러나 “하늘을 두려워 않고 자연을 넘보면서 뿌린 오만의 씨앗”(?원 달러?)으로 인한 재앙과 “매몰찬 둑에 뎅겅 허리를 잘리기도 하는”(?담담해서 아름답게 강물은 흐르고?) 강을 바라보면서 마구잡이 환경 파괴에 비판의 시선을 내쏘기도 한다. 지구상 곳곳에서 지진으로 수많은 목숨이 땅에 묻히고, 허리케인과 쓰나미가 덮쳐 수천수만의 생명을 휩쓸어간 재앙의 현장에서 시인은 “쓰나미 속에서 팔 하나가 잘려나간 부처님”이 “빙그레 웃고만 계신”(?빙그레 웃고만 계신다?) 모습에 섬뜩함을 느끼기도 하면서, “하느님은 지금/어데서 어떤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가”(?신발들?) 탄식하듯 묻는다.
백성이 낸 세금으로 오히려 나라가 나서서/강을 파헤치고 산을 허물고 있으니/나라는 망해도 산하는 남는다는 옛 시구절은/이제 허사가 되었다.//불도저가 파헤치고 있는 것이/강바닥이 아니라 제 심장이라는,/다이너마이트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바위너설이 아니라 제 팔다리라는,/오랜 촌로들의 항의 따위 한낱/힘없는 넋두리로만 들리는 강마을은 서럽다.(?옛 나루에 비가 온다? 부분)
외로운 존재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는 시의 손길
일찍이 문학평론가 최원식이 “우리 시대의 두보(杜甫)”라 일컬었듯이 신경림 시인은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민초들과 더불어 저잣거리에 섞여 살면서 하찮은 존재들의 슬픔과 한, 그들의 굴곡진 삶의 풍경과 애환을 질박하고 친근한 생활 언어로 노래해온 ‘민중적 서정시인’으로서 자리매김해왔다. “화려한 것들과 찬란한 것들”(?섬?)의 볕바른 중심에 서 있기보다는 “늘 음지에 서”(?쓰러진 것들을 위하여?)서, “세상에서 버려져 살아온 사람들”(?빨간 풍선)과 “꽃 같은 생애와는 무관할 것 같은 민중의 헐거운 삶”(박성우, 추천사)을 끌어안으며 “언 손 굽은 등 두루두루 어르면서”(?이 땅에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집권자들의 횡포에 삶의 뿌리를 잃”은 “가난하고 힘없는”(?인생은 나병환자와 같은 것이니?) 외로운 존재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길은 언제나 더없이 따뜻하기만 하다.
그의 가난과 추위가 어디 그만의 것이랴./그는 좁은 어깨와 야윈 가슴으로 나의 고통까지 떠안고/역 대합실에 신문지를 덮고 누워 있다./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는다./간혹 스치는 것은 모멸과 미혹의 눈길뿐./마침내 그는 대합실에서도 쫓겨나 거리를 방황하게 된다.//찬 바람이 불고 눈발이 치는 날 그의 영혼은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다./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올라가 못 박히는 대신/그의 육신은 멀리 내쫓겨 광야에서 눈사람이 되겠지만.//그 언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도/사람들은 그가 부활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을 것이다./다시 대합실에 신문지를 덮고 그들을 대신해서 누워 있으리라는 걸.//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을 모두 끌어안고서.(?나의 예수? 전문)
그리하여 시인은 오늘도 “너무나 달라져, 그래서 모두들 너무나 외로”(?빨간 풍선?)운 세상 한복판에서 스무살 청춘의 설렘과 순정한 마음을 가다듬으며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눈물과 더불어 한숨과 더불어 통곡과 더불어”(?이 땅에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가난한 사랑노래를 부른다. “가시밭을 헤치면서도 나아가는 우리들의 힘”과 “어둠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우리들의 꿈”(?제주에 와서?)을 나지막이 노래 부르며 “주검처럼 내쳤던 섬이./꽃향기와 새와 벌레의 노랫소리로/온 서울을 들썩이게 하”(?섬?)듯, 죽어간 것과 살아 있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하나가 되고, 하늘과 땅과 그 사이 모든 공간도 하나가 되어 우주 뭇 생령이 ‘더불어’ 어우러지며 함께 살아가는 대동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이 땅에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더불어 숨 쉬고 사는 모든 것을 위하여/내 터를 아름답게 만들겠다 죽어간 것을 위하여/이 땅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는 것을 위하여/땅속에서 깊고 넓게 숨어 있는 것을 위하여/언젠가 힘차게 솟아오를 것을 위하여//산과 더불어 바다와 더불어 강과 더불어/나무와 풀과 꽃과 바위와 더불어/짐승과 새와 벌나비와 더불어/이 땅에 땀 흘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이 땅에 힘겹게 살다 간 사람들과 더불어/이 땅에 언제까지고 살아갈 사람들과 더불어(?이 땅에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