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검색
본문
Powered by NAVER OpenAP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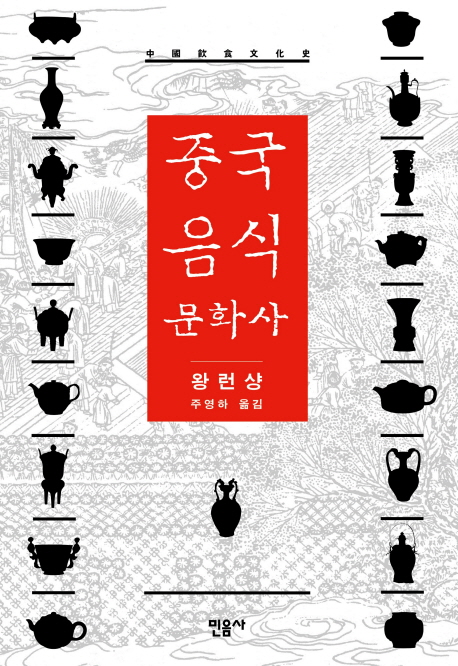
-
중국음식문화사
저자 : 왕런샹
출판사 : 민음사
출판년 : 2010
ISBN : 9788937426919
책소개
5000년 중국 음식의 역사를 한눈에 읽는다!
『중국음식문화사』는 선사 시대부터 춘추 전국 시대, 위진 남북조를 거쳐 명나라, 청나라까지 연대순으로, 시대에 따른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관련하여 중국의 음식 문화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서술한 책이다. , , 등 수많은 문헌에 등장하는 음식 목록과 예법들을 소개하며, 각 시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식품과 음식의 특성과 맛, 그리고 그 음식들에 얽힌 역사적인 사실과 일화들을 들려준다. 더불어 음식과 관련한 여러 시문들을 인용하고, 당대 풍속을 담은 그림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중국음식문화사』는 선사 시대부터 춘추 전국 시대, 위진 남북조를 거쳐 명나라, 청나라까지 연대순으로, 시대에 따른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관련하여 중국의 음식 문화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서술한 책이다. , , 등 수많은 문헌에 등장하는 음식 목록과 예법들을 소개하며, 각 시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식품과 음식의 특성과 맛, 그리고 그 음식들에 얽힌 역사적인 사실과 일화들을 들려준다. 더불어 음식과 관련한 여러 시문들을 인용하고, 당대 풍속을 담은 그림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선사시대부터 청나라 때에 이르기까지 중국 음식의 모든 것을 한 권으로 집대성한 독보적 저작
5000년 중국 음식의 역사를 한 권으로 집대성한, 왕런샹의 독보적 저작 『중국 음식 문화사』가 주영하의 번역으로 민음사에서 출간되었다.
오랫동안 중국 음식 문화를 연구해 온 음식 고고학자 왕런샹이 그간 자신의 모든 연구를 집대성한 책으로, 오늘날까지도 중국 음식에 관한 책들 중에서 독보적인 저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 음식 문화사』는, 선사시대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 식생활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선사시대 중국인들의 식생활에서 시작하여 시대의 변천에 따른 음식과 술과 차, 식기류를 살펴보고 음식점과 주점, 찻집의 유행을 짚어 볼 뿐 아니라, 황제의 식탁과 서민의 식탁을 함께 엿보고, 예속과 세시 음식을 찬찬히 살펴보는 등, 이 책은 음식 그 자체뿐 아니라 문학, 철학, 고고학, 역사, 미술사 등 방대한 분야에 걸쳐 중국 음식의 문화사를 한 권에 총망라하고 있다.
음식 연구가들에게 오랫동안 중국 음식 문화에 관한 정본 역할을 해 온 이 책은, 동아시아의 음식 문화와 교류를 연구해 온 주영하 교수가 8년 이상 애정을 쏟아 충실하게 번역했다. 무엇보다, 국내 독자들에게 생소한 음식이나 식재료, 내용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이나 일화, 저자와 다른 학문적 견해, 한중일 음식 문화 비교 등에 관한 600여 개에 달하는 충실한 주석을 달아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우리나라 음식이 지닌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도 필수적인 중국인의 식탁을 살펴봄으로써, 음식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뿐 아니라 음식과 인생에 대한 새로운 ‘맛’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은 눈을 즐겁게 하고, 음악은 귀를 즐겁게 하여 모두 미학이 된다.
음식은 입을 즐겁게 하니 어찌 이것만 다르겠는가?”
음식은 문화를 표현한다. 음식을 먹는 것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활동의 하나일 뿐 아니라 일종의 문화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학문적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연구해 왔다. 이러한 음식 문화는 당대 사회의 영향 속에서 더 발전하거나 쇠퇴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민족과의 교류를 통해 더 풍성해지면서, 한 민족의 문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특히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중국 음식은, 중국의 전통 문화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중국인의 음식들, 조리법, 예속 등은 그 자체로 다른 민족과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중국 성현들은 인생의 비밀들이 음식에 있다고 주장”해 왔기에, 중국의 음식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춘추 전국 시대의 제자백가를 보더라도, 유가, 도가, 묵가 등 당시 출현한 많은 학파는 각기 그 학술 사상과 관련한 음식 이론을 주창했고, 이는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중에서 공자의 유학이 중국 고대 문화 발전의 핵심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반듯하게 썬 음식이 아니면 먹지 말라’거나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라’, ‘길거리 음식은 먹지 말라.’ 등 음식에 대한 유가의 사상과 관념 역시 고대 중국의 음식 문화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전국 시대 초나라 시인 굴원(屈原)의 시 「초혼(招魂)」을 보면, 시구마다 초나라 사람들이 먹던 음식을 갖다 붙임으로써 음식의 조리와 관련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단맛, 매운맛, 쓴맛, 신맛, 짠맛의 오미(五味)가 어우러진 음식도 있고 / 푹 끓인 우족의 힘줄이 맛있는 향기를 풍기는구나 (……) 술지게미를 걸러 내 얼린 빙동주(氷凍酒)를 마시니 진하면서 시원하고/ 술을 따르는 데 쓰는 화려한 주두(酒斗)에는 신선이 마시는 술인 경장(瓊漿)이 이미 담겼구나.” 초나라에는 망자의 넋을 부를 때 실제로 음식과 식기를 차려 놓고 무덤에 함께 묻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 시는 당대의 분위기를 잘 보여 준다.
그런가 하면 “꽃밭에서 술 한 항아리 놓고 앉아, 아무도 없이 홀로 술을 따르네/ 밝은 달에 잔을 들어 올리니 나와 그림자와 달이 셋이 되었네 (……) 석잔 술에 큰 도(道)에 통하고, 한 말 술에 자연과 하나가 되었네/ 다만 취하여 얻는 즐거움을 깨어 있는 이들에게 전하지 마라.” 이 시는 당나라 문인 이백의 「달빛 아래 홀로 술을 마시며(月下獨酌)」의 몇 구절이다.
백거이, 이백, 두보 등 당나라 문인들은 술을 유난히 좋아하여, 술과 관련한 시나 문장을 많이 노래하면서 당대의 술 문화를 주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당나라에서는 명주가 탄생되기도 했다.
송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사대부들이 친구끼리 차를 마시며 차 맛을 평가하는 것을 즐겼다. 『청이록』에는 “찻물을 붓고 숟가락으로 휘저어…… 찻물로 물고기, 꽃, 풀 등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찻물 위에 환상적으로 시의 글자를 나타나게 하는 기술로 “한 잔에 하나의 절구, 네 잔이면 4언 절구가 완성되는” 뛰어난 다도 기술에 대한 언급도 있다. 시문과 다예 모두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중국인은 음식에 대한 기본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먹을거리의 개발과 이용과 더불어 조리술과 조리 기구와 식기가 발전하고, 음식 예절이 중시되며, 음식과 관련된 철학, 예술 등이 꽃필 수밖에 없었고, 그럼으로써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더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왕런샹은 “중국 음식에는 중국의 전통 문화가 걸어온 길이 기록되어 있고, 중국의 오랜 문명의 빛이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더 깊고 풍요로운 중국 음식의 세계
이 책은 선사 시대부터 춘추 전국 시대, 위진 남북조를 거쳐 명나라, 청나라까지 연대순으로, 시대에 따른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관련하여 중국의 음식 문화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서술한다. 예컨대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중국 역사에서도 특히 전란이 가장 심했던 춘추 전국 시대에, 전쟁의 승부는 군사력으로 결정되지만 때로는 술과 음식으로 결정되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음식은 한 가정과 나랏일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했다.
또 『예기(禮記)』, 『식경(食經)』, 『제민요술(齊民要術)』, 『다경(茶經)』, 『수원식단(隨園食單)』 등 수많은 문헌에 등장하는 음식 목록과 예법들을 소개하며, 각 시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식품과 음식의 특성과 맛, 그리고 그 음식들에 얽힌 역사적인 사실과 일화들을 들려준다. 가령 주나라 때의 음식 예법과 관습을 정리한 『주례(周禮)』,『의례(儀禮)』,『예기』는 음식을 먹을 때의 예법, 손님을 대접하는 예법, 상례 음식에 대한 예법 등을 소개하고, 나라의 연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당나라 이전에 나온 조리서 중 으뜸으로 치는 『제민요술』에는 고깃국, 절임 생선, 밥과 병, 뎬신뿐 아니라 백성들이 먹었던 채소 음식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과 관련한 여러 시문들을 인용하고, 당대 풍속을 담은 그림들을 보여 준다. 연회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는, 당나라의 위씨 가족의 무덤 벽화 「야연도(野宴圖)」와 장수하는 노인들을 위한 청나라 궁중 연회 ‘청수연’을 묘사한 「청궁천수연도(淸宮千?宴圖)」 등이 유명하다. 그런가 하면 너비 5미터가 넘는 풍속도「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는 송나라 도읍 변량 사람들의 생활과 상업 활동이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수많은 사료들을 통한 풍부한 고증과 다양한 에피소드로, 오랜 역사를 지닌 중국의 시?공간을 감각적으로 넘나들면서 중국 음식 문화를 흥미롭게 풀어나간다.
중국은 문명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조리 기술이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받는데, 이미 신석기 때 과실주를 만들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술은 식초, 간장 등을 만드는 양조기술의 효시로 인류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3000여 년 전에 발명된 누룩은 나침반, 화약, 종이, 인쇄술과 함께 중국의 ‘5대 발명’에 속한다.
인간과 신을 통하게 하기 위해 청동기 식기류를 많이 개발했던 상 왕조가 술과 고기로 인한 사치생활로 멸망하자, 이를 교훈으로 서주 시대는 금주를 미덕으로 삼아, 당시의 무덤들에서는 이전에 비해 주기가 덜 출토되었다고 한다. 주나라 조리 기술은 중국 음식 조리법의 오래된 정통의 기초가 되었고, 당시의 음식 예법과 관습은 오늘날의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식이요법과 금기 음식에 대한 이론이 생기기 시작했고, 앞서 언급한 제자백가의 등장으로 유가가 음식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한나라 때는 서역과의 문화 교류로 향신료 등을 들여오면서, 음식 문화는 또 한 번 발전하게 된다.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일으키고자 연회가 성행하기도 했으나, 무분별한 음주로 결국 “세 사람 이상이 까닭 없이 한자리에 모여 술을 마시면 일금 넉 냥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율령까지 생겼다. 한편 낮고 작은 밥상이 유행하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일반 사대부 가정에서 ‘눈썹 높이까지 밥상을 드는’ 거안제미의 예법이 이때 나왔다.
난세였던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음식에 있어서도 사치와 검소가 극단적으로 어디서나 존재했다. 음식의 맛뿐 아니라 모양, 진열을 중시하는 특별한 풍조가 생겨났고, 조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늘날의 미식가에 해당하는 ‘지미자’가 이전 시대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 또한 이 시기는, 유구한 세월을 거쳐 이미 이전 시대에 풍속으로 자리 잡았던 ‘명절’이 전통 문화로 자리 잡은 때이기도 하다.
수당 시대에 이르러 정세가 안정되면서, 음식 문화도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다. 각종 연회가 잦았고, 의학과 약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양생법을 내세웠다. 연회는 이전 시대에 비해 사치스러웠으며, 앞서 얘기했듯 당나라 문인들 덕분에 명주가 탄생했다.
이후 송나라에 이르러 도읍을 변량으로 옮기면서 수많은 점포가 생겼는데, 이중 술집과 음식점이 크게 들어서게 되었다. 한편 남송은 임안에 도읍을 정하게 되어 역사에 유례없던 남방과 북방의 음식 교류가 이루어졌다. 임안에는 술집과 나란히 찻집도 들어섰고, 사대부들은 친구끼리 차 맛을 즐기고 평가하는 것을 즐겼다.
민간에서 형성되어 일반 백성들이 풍속을 주도했던 세시 음식은 황궁으로 서서히 들어가 명나라 때에는 민간의 세시 풍속이 궁중에서도 행해졌다. 황제의 식탁은 명나라를 거쳐 청나라에 이르면서 더 화려해졌고, 이는 백성들의 식탁과는 너무도 달랐다. 청나라 사람들이 어떤 음식들을 즐겼는지는, 청나라 소설가 조설근(曹雪芹)이 쓴 장편소설 『홍루몽(紅樓夢)』을 보면 알 수 있다. 음식의 도를 집대성한 원매의『수원식단』은 오늘날까지 합리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책속으로 추가]
임홍(林洪)은 『산가청공(山家淸供)』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을 적었다.
송나라 태종 조광의(趙匡義, 939~997)는 한림학사 승지인 소이간(蘇易簡)에게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어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소이간이 대답하기를, “음식에는 정해진 맛이 없습니다. 입에 맞는 음식이 맛있습니다. 신의 체험에 의하면, 제즙(?汁)이 제일 맛있었습니다.”라고 했다. 태종이 이 말을 듣고, 그 뜻이 분명하지 못해서 다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소이간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이 굉장히 추운 어느 날 밤에 따뜻한 난로를 마주하고 좋은 술을 데워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 몇 잔이 배 속에 들어가니 곧 취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깨어 나니 목이 매우 말랐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일어나…… 마당에 나왔습니다. …… 눈이 쌓인 곳에 ‘제’를 담은 단지가 보였습니다. 시동을 부를 사이도 없이…… 시큼시큼한 제즙을 몇 사발 들이켰습니다. 신은 당시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늘의 신선 부엌에 있는 난포봉지(鸞脯鳳脂)도 이 제즙의 맛에 비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임홍은 이 제즙을 ‘영호진(永壺珍)’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제즙은 밀가루를 푼 물에 채소 국물을 붓고 소금에 절여 만든 음식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술이 깨면서 생기는 갈증을 멈추는 데 효과가 있다. 소이간은 술에 취한 나머지 그 맛이 너무 좋아 비길 음식이 없다고 느낀 것이다.
- 431p, 「음식을 먹을 때 가져야 할 다섯 가지 생각」 중에서
황제가 매일 소비해야 하는 정해진 음식 분량은 다음과 같았다. 반육(盤肉, 살코기) 스물두 근, 탕육(湯肉, 탕에 쓰는 고기) 다섯 근, 돼지기름 한 근, 양 두 마리, 닭 다섯 마리, 오리 세 마리였다. 채소류는 배추, 시금치, 향채, 미나리, 부추 등이 모두 열아홉 근이었다. 무, 수나복(水蘿蔔, 큰뱀무), 당근이 모두 예순 개였다. 포과(包瓜, 박)와 동과(冬瓜)가 각각 한 개씩 들어갔다. 비람(?藍)과 말린 옹채(?菜, 나팔꽃 나물)가 각각 다섯 개로 여섯 근을 필요로 했다. 옥천주(玉泉酒) 네 냥(兩), 된장과 간장 각각 세 근, 식초 두 근이 들어 갔다. 또한 조선과 만선에 발발 여덟 접시가 마련되었는데, 한 접시에 서른 개씩 놓았다. 어차방에서는 황제에게 매일 마실 차와 우유 등을 특별히 마련했다. 황제에게는 관례에 따라 젖소 쉰 마리가 배당되었는데, 한 마리의 젖소에서 매일 두 근의 젖을 짰다. 그리고 매일 베이징 서쪽에 있는 옥천수(玉泉水)를 열두 관, 크림(乳油) 한 근, 찻잎 일흔다섯 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 476p, 「황제의 식사」 중에서
5000년 중국 음식의 역사를 한 권으로 집대성한, 왕런샹의 독보적 저작 『중국 음식 문화사』가 주영하의 번역으로 민음사에서 출간되었다.
오랫동안 중국 음식 문화를 연구해 온 음식 고고학자 왕런샹이 그간 자신의 모든 연구를 집대성한 책으로, 오늘날까지도 중국 음식에 관한 책들 중에서 독보적인 저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 음식 문화사』는, 선사시대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 식생활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선사시대 중국인들의 식생활에서 시작하여 시대의 변천에 따른 음식과 술과 차, 식기류를 살펴보고 음식점과 주점, 찻집의 유행을 짚어 볼 뿐 아니라, 황제의 식탁과 서민의 식탁을 함께 엿보고, 예속과 세시 음식을 찬찬히 살펴보는 등, 이 책은 음식 그 자체뿐 아니라 문학, 철학, 고고학, 역사, 미술사 등 방대한 분야에 걸쳐 중국 음식의 문화사를 한 권에 총망라하고 있다.
음식 연구가들에게 오랫동안 중국 음식 문화에 관한 정본 역할을 해 온 이 책은, 동아시아의 음식 문화와 교류를 연구해 온 주영하 교수가 8년 이상 애정을 쏟아 충실하게 번역했다. 무엇보다, 국내 독자들에게 생소한 음식이나 식재료, 내용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이나 일화, 저자와 다른 학문적 견해, 한중일 음식 문화 비교 등에 관한 600여 개에 달하는 충실한 주석을 달아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우리나라 음식이 지닌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도 필수적인 중국인의 식탁을 살펴봄으로써, 음식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뿐 아니라 음식과 인생에 대한 새로운 ‘맛’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은 눈을 즐겁게 하고, 음악은 귀를 즐겁게 하여 모두 미학이 된다.
음식은 입을 즐겁게 하니 어찌 이것만 다르겠는가?”
음식은 문화를 표현한다. 음식을 먹는 것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활동의 하나일 뿐 아니라 일종의 문화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학문적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연구해 왔다. 이러한 음식 문화는 당대 사회의 영향 속에서 더 발전하거나 쇠퇴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민족과의 교류를 통해 더 풍성해지면서, 한 민족의 문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특히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중국 음식은, 중국의 전통 문화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중국인의 음식들, 조리법, 예속 등은 그 자체로 다른 민족과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중국 성현들은 인생의 비밀들이 음식에 있다고 주장”해 왔기에, 중국의 음식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춘추 전국 시대의 제자백가를 보더라도, 유가, 도가, 묵가 등 당시 출현한 많은 학파는 각기 그 학술 사상과 관련한 음식 이론을 주창했고, 이는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중에서 공자의 유학이 중국 고대 문화 발전의 핵심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반듯하게 썬 음식이 아니면 먹지 말라’거나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라’, ‘길거리 음식은 먹지 말라.’ 등 음식에 대한 유가의 사상과 관념 역시 고대 중국의 음식 문화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전국 시대 초나라 시인 굴원(屈原)의 시 「초혼(招魂)」을 보면, 시구마다 초나라 사람들이 먹던 음식을 갖다 붙임으로써 음식의 조리와 관련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단맛, 매운맛, 쓴맛, 신맛, 짠맛의 오미(五味)가 어우러진 음식도 있고 / 푹 끓인 우족의 힘줄이 맛있는 향기를 풍기는구나 (……) 술지게미를 걸러 내 얼린 빙동주(氷凍酒)를 마시니 진하면서 시원하고/ 술을 따르는 데 쓰는 화려한 주두(酒斗)에는 신선이 마시는 술인 경장(瓊漿)이 이미 담겼구나.” 초나라에는 망자의 넋을 부를 때 실제로 음식과 식기를 차려 놓고 무덤에 함께 묻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 시는 당대의 분위기를 잘 보여 준다.
그런가 하면 “꽃밭에서 술 한 항아리 놓고 앉아, 아무도 없이 홀로 술을 따르네/ 밝은 달에 잔을 들어 올리니 나와 그림자와 달이 셋이 되었네 (……) 석잔 술에 큰 도(道)에 통하고, 한 말 술에 자연과 하나가 되었네/ 다만 취하여 얻는 즐거움을 깨어 있는 이들에게 전하지 마라.” 이 시는 당나라 문인 이백의 「달빛 아래 홀로 술을 마시며(月下獨酌)」의 몇 구절이다.
백거이, 이백, 두보 등 당나라 문인들은 술을 유난히 좋아하여, 술과 관련한 시나 문장을 많이 노래하면서 당대의 술 문화를 주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당나라에서는 명주가 탄생되기도 했다.
송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사대부들이 친구끼리 차를 마시며 차 맛을 평가하는 것을 즐겼다. 『청이록』에는 “찻물을 붓고 숟가락으로 휘저어…… 찻물로 물고기, 꽃, 풀 등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찻물 위에 환상적으로 시의 글자를 나타나게 하는 기술로 “한 잔에 하나의 절구, 네 잔이면 4언 절구가 완성되는” 뛰어난 다도 기술에 대한 언급도 있다. 시문과 다예 모두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중국인은 음식에 대한 기본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먹을거리의 개발과 이용과 더불어 조리술과 조리 기구와 식기가 발전하고, 음식 예절이 중시되며, 음식과 관련된 철학, 예술 등이 꽃필 수밖에 없었고, 그럼으로써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더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왕런샹은 “중국 음식에는 중국의 전통 문화가 걸어온 길이 기록되어 있고, 중국의 오랜 문명의 빛이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더 깊고 풍요로운 중국 음식의 세계
이 책은 선사 시대부터 춘추 전국 시대, 위진 남북조를 거쳐 명나라, 청나라까지 연대순으로, 시대에 따른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관련하여 중국의 음식 문화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서술한다. 예컨대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중국 역사에서도 특히 전란이 가장 심했던 춘추 전국 시대에, 전쟁의 승부는 군사력으로 결정되지만 때로는 술과 음식으로 결정되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음식은 한 가정과 나랏일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했다.
또 『예기(禮記)』, 『식경(食經)』, 『제민요술(齊民要術)』, 『다경(茶經)』, 『수원식단(隨園食單)』 등 수많은 문헌에 등장하는 음식 목록과 예법들을 소개하며, 각 시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식품과 음식의 특성과 맛, 그리고 그 음식들에 얽힌 역사적인 사실과 일화들을 들려준다. 가령 주나라 때의 음식 예법과 관습을 정리한 『주례(周禮)』,『의례(儀禮)』,『예기』는 음식을 먹을 때의 예법, 손님을 대접하는 예법, 상례 음식에 대한 예법 등을 소개하고, 나라의 연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당나라 이전에 나온 조리서 중 으뜸으로 치는 『제민요술』에는 고깃국, 절임 생선, 밥과 병, 뎬신뿐 아니라 백성들이 먹었던 채소 음식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과 관련한 여러 시문들을 인용하고, 당대 풍속을 담은 그림들을 보여 준다. 연회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는, 당나라의 위씨 가족의 무덤 벽화 「야연도(野宴圖)」와 장수하는 노인들을 위한 청나라 궁중 연회 ‘청수연’을 묘사한 「청궁천수연도(淸宮千?宴圖)」 등이 유명하다. 그런가 하면 너비 5미터가 넘는 풍속도「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는 송나라 도읍 변량 사람들의 생활과 상업 활동이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수많은 사료들을 통한 풍부한 고증과 다양한 에피소드로, 오랜 역사를 지닌 중국의 시?공간을 감각적으로 넘나들면서 중국 음식 문화를 흥미롭게 풀어나간다.
중국은 문명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조리 기술이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받는데, 이미 신석기 때 과실주를 만들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술은 식초, 간장 등을 만드는 양조기술의 효시로 인류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3000여 년 전에 발명된 누룩은 나침반, 화약, 종이, 인쇄술과 함께 중국의 ‘5대 발명’에 속한다.
인간과 신을 통하게 하기 위해 청동기 식기류를 많이 개발했던 상 왕조가 술과 고기로 인한 사치생활로 멸망하자, 이를 교훈으로 서주 시대는 금주를 미덕으로 삼아, 당시의 무덤들에서는 이전에 비해 주기가 덜 출토되었다고 한다. 주나라 조리 기술은 중국 음식 조리법의 오래된 정통의 기초가 되었고, 당시의 음식 예법과 관습은 오늘날의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식이요법과 금기 음식에 대한 이론이 생기기 시작했고, 앞서 언급한 제자백가의 등장으로 유가가 음식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한나라 때는 서역과의 문화 교류로 향신료 등을 들여오면서, 음식 문화는 또 한 번 발전하게 된다.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일으키고자 연회가 성행하기도 했으나, 무분별한 음주로 결국 “세 사람 이상이 까닭 없이 한자리에 모여 술을 마시면 일금 넉 냥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율령까지 생겼다. 한편 낮고 작은 밥상이 유행하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일반 사대부 가정에서 ‘눈썹 높이까지 밥상을 드는’ 거안제미의 예법이 이때 나왔다.
난세였던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음식에 있어서도 사치와 검소가 극단적으로 어디서나 존재했다. 음식의 맛뿐 아니라 모양, 진열을 중시하는 특별한 풍조가 생겨났고, 조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늘날의 미식가에 해당하는 ‘지미자’가 이전 시대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 또한 이 시기는, 유구한 세월을 거쳐 이미 이전 시대에 풍속으로 자리 잡았던 ‘명절’이 전통 문화로 자리 잡은 때이기도 하다.
수당 시대에 이르러 정세가 안정되면서, 음식 문화도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다. 각종 연회가 잦았고, 의학과 약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양생법을 내세웠다. 연회는 이전 시대에 비해 사치스러웠으며, 앞서 얘기했듯 당나라 문인들 덕분에 명주가 탄생했다.
이후 송나라에 이르러 도읍을 변량으로 옮기면서 수많은 점포가 생겼는데, 이중 술집과 음식점이 크게 들어서게 되었다. 한편 남송은 임안에 도읍을 정하게 되어 역사에 유례없던 남방과 북방의 음식 교류가 이루어졌다. 임안에는 술집과 나란히 찻집도 들어섰고, 사대부들은 친구끼리 차 맛을 즐기고 평가하는 것을 즐겼다.
민간에서 형성되어 일반 백성들이 풍속을 주도했던 세시 음식은 황궁으로 서서히 들어가 명나라 때에는 민간의 세시 풍속이 궁중에서도 행해졌다. 황제의 식탁은 명나라를 거쳐 청나라에 이르면서 더 화려해졌고, 이는 백성들의 식탁과는 너무도 달랐다. 청나라 사람들이 어떤 음식들을 즐겼는지는, 청나라 소설가 조설근(曹雪芹)이 쓴 장편소설 『홍루몽(紅樓夢)』을 보면 알 수 있다. 음식의 도를 집대성한 원매의『수원식단』은 오늘날까지 합리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책속으로 추가]
임홍(林洪)은 『산가청공(山家淸供)』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을 적었다.
송나라 태종 조광의(趙匡義, 939~997)는 한림학사 승지인 소이간(蘇易簡)에게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어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소이간이 대답하기를, “음식에는 정해진 맛이 없습니다. 입에 맞는 음식이 맛있습니다. 신의 체험에 의하면, 제즙(?汁)이 제일 맛있었습니다.”라고 했다. 태종이 이 말을 듣고, 그 뜻이 분명하지 못해서 다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소이간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이 굉장히 추운 어느 날 밤에 따뜻한 난로를 마주하고 좋은 술을 데워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 몇 잔이 배 속에 들어가니 곧 취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깨어 나니 목이 매우 말랐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일어나…… 마당에 나왔습니다. …… 눈이 쌓인 곳에 ‘제’를 담은 단지가 보였습니다. 시동을 부를 사이도 없이…… 시큼시큼한 제즙을 몇 사발 들이켰습니다. 신은 당시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늘의 신선 부엌에 있는 난포봉지(鸞脯鳳脂)도 이 제즙의 맛에 비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임홍은 이 제즙을 ‘영호진(永壺珍)’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제즙은 밀가루를 푼 물에 채소 국물을 붓고 소금에 절여 만든 음식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술이 깨면서 생기는 갈증을 멈추는 데 효과가 있다. 소이간은 술에 취한 나머지 그 맛이 너무 좋아 비길 음식이 없다고 느낀 것이다.
- 431p, 「음식을 먹을 때 가져야 할 다섯 가지 생각」 중에서
황제가 매일 소비해야 하는 정해진 음식 분량은 다음과 같았다. 반육(盤肉, 살코기) 스물두 근, 탕육(湯肉, 탕에 쓰는 고기) 다섯 근, 돼지기름 한 근, 양 두 마리, 닭 다섯 마리, 오리 세 마리였다. 채소류는 배추, 시금치, 향채, 미나리, 부추 등이 모두 열아홉 근이었다. 무, 수나복(水蘿蔔, 큰뱀무), 당근이 모두 예순 개였다. 포과(包瓜, 박)와 동과(冬瓜)가 각각 한 개씩 들어갔다. 비람(?藍)과 말린 옹채(?菜, 나팔꽃 나물)가 각각 다섯 개로 여섯 근을 필요로 했다. 옥천주(玉泉酒) 네 냥(兩), 된장과 간장 각각 세 근, 식초 두 근이 들어 갔다. 또한 조선과 만선에 발발 여덟 접시가 마련되었는데, 한 접시에 서른 개씩 놓았다. 어차방에서는 황제에게 매일 마실 차와 우유 등을 특별히 마련했다. 황제에게는 관례에 따라 젖소 쉰 마리가 배당되었는데, 한 마리의 젖소에서 매일 두 근의 젖을 짰다. 그리고 매일 베이징 서쪽에 있는 옥천수(玉泉水)를 열두 관, 크림(乳油) 한 근, 찻잎 일흔다섯 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 476p, 「황제의 식사」 중에서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머리말
1 역사 이전의 식생활
새와 짐승 따위를 털도 뽑지 않고 피도 씻지 않고 먹다
수인씨가 불을 만들다
신농씨가 곡물을 뿌리다
황제가 밥을 짓게 하다
2 술과 고기를 즐기다
의적이 처음으로 술을 만들다
이윤이 맛을 말하다
도철은 동방에서 왔다
술이 못을 이루고 매달아 둔 고기가 숲을 이루다
3 음악을 들으면서 음식을 먹다
아홉 개의 정과 여덟 개의 궤
팔진과 백수
장은 소금에서 나온다
음식을 숭상하는 천관들
예는 음과 식에서 시작한다
4 다섯 가지 맛으로 조화를 이루다
음식은 가정과 나라의 일과도 관련 있다
식객이 3000명에 이르다
넋이여, 돌아오라
오미의 사용
제자백가의 음식에 대한 가르침
5 외부의 음식을 받아들여 융합시키다
맛있는 음식은 서아시아에서 왔다
지하에 묻힌 밥상
오후가 보낸 맛있는 고기와 생선
병과 보리밥
상을 올릴 때 눈썹 높이까지 올려 든다
외국 음식을 즐기는 황제
6 난세의 음식 풍속
술을 물처럼 여기고 고기를 콩잎처럼 여긴다
술을 즐기는 명사
순챗국과 농어회
어진 물과 의로운 조
명절마다 나는 음식 향기
일반 백성의 음식 조리 기술
7 신과 더불어 배불리 즐기다
관직에 나아가 친구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다
3월에 나오는 앵두와 죽순
서역에서 온 미녀와 맛있는 술
취중에 얻는 지혜
차를 끓여 마시며 마음을 맑게 하다
금은으로 만든 그릇
먹는 것도 약이다
8 무성하게 모여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다
변량과 임안, 두 도읍의 음식점
양은 커야 맛있다
우아한 모임에서 생선회를 치다
음식을 먹을 때 가져야 할 다섯 가지 생각
용과 봉황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단차
약선 음식의 우아한 차림
9 특이하고 색다른 음식이 가득하다
궁중의 식생활
황제의 식사
장수하는 노인들을 위해 천수연을 열다
『홍루몽』의 술과 음식
고향 음식도 그 맛은 좋다
소식의 맑고 깨끗함
음식의 도
후기
옮긴이의 말
주석
찾아보기
1 역사 이전의 식생활
새와 짐승 따위를 털도 뽑지 않고 피도 씻지 않고 먹다
수인씨가 불을 만들다
신농씨가 곡물을 뿌리다
황제가 밥을 짓게 하다
2 술과 고기를 즐기다
의적이 처음으로 술을 만들다
이윤이 맛을 말하다
도철은 동방에서 왔다
술이 못을 이루고 매달아 둔 고기가 숲을 이루다
3 음악을 들으면서 음식을 먹다
아홉 개의 정과 여덟 개의 궤
팔진과 백수
장은 소금에서 나온다
음식을 숭상하는 천관들
예는 음과 식에서 시작한다
4 다섯 가지 맛으로 조화를 이루다
음식은 가정과 나라의 일과도 관련 있다
식객이 3000명에 이르다
넋이여, 돌아오라
오미의 사용
제자백가의 음식에 대한 가르침
5 외부의 음식을 받아들여 융합시키다
맛있는 음식은 서아시아에서 왔다
지하에 묻힌 밥상
오후가 보낸 맛있는 고기와 생선
병과 보리밥
상을 올릴 때 눈썹 높이까지 올려 든다
외국 음식을 즐기는 황제
6 난세의 음식 풍속
술을 물처럼 여기고 고기를 콩잎처럼 여긴다
술을 즐기는 명사
순챗국과 농어회
어진 물과 의로운 조
명절마다 나는 음식 향기
일반 백성의 음식 조리 기술
7 신과 더불어 배불리 즐기다
관직에 나아가 친구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다
3월에 나오는 앵두와 죽순
서역에서 온 미녀와 맛있는 술
취중에 얻는 지혜
차를 끓여 마시며 마음을 맑게 하다
금은으로 만든 그릇
먹는 것도 약이다
8 무성하게 모여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다
변량과 임안, 두 도읍의 음식점
양은 커야 맛있다
우아한 모임에서 생선회를 치다
음식을 먹을 때 가져야 할 다섯 가지 생각
용과 봉황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단차
약선 음식의 우아한 차림
9 특이하고 색다른 음식이 가득하다
궁중의 식생활
황제의 식사
장수하는 노인들을 위해 천수연을 열다
『홍루몽』의 술과 음식
고향 음식도 그 맛은 좋다
소식의 맑고 깨끗함
음식의 도
후기
옮긴이의 말
주석
찾아보기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