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검색
본문
Powered by NAVER OpenAP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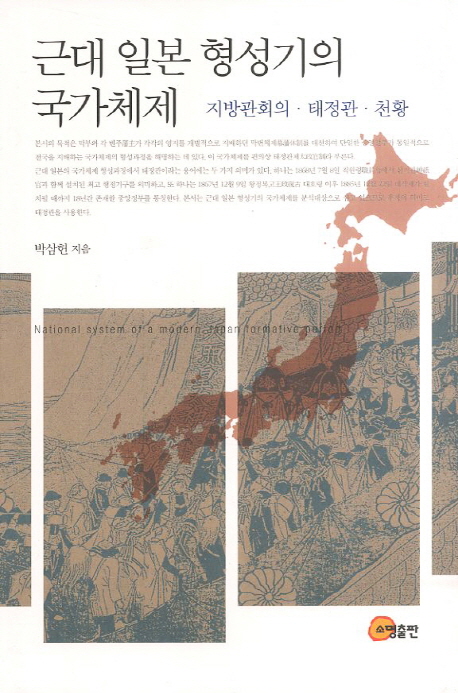
-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체제 (지방관회의.태정관.천황)
저자 : 박삼헌
출판사 : 소명출판
출판년 : 2012
ISBN : 9788956266817
책소개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체제-지장관회의ㆍ태정관ㆍ천황』은 2003년 코베대학에서 발표된 논문 와 이후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발표된 논문들을 촘촘하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 책은 막부와 각 번주가 각각의 영지를 개별적으로 지배하던 막번체제를 대신하여 단일한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전국을 지배하는 국가체제의 형성과정을 추적 해명한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국민’의 권리를 ‘신민’의 권리로, 일본의 근대적 국가체제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체제-지방관회의ㆍ태정관ㆍ천황」(이후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체제」)은 2003년 코베대학에서 발표된 논문 「일본 근대 국가 형성과 태정관제」와 이후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발표된 논문들을 촘촘하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막부와 각 번주(藩主)가 각각의 영지를 개별적으로 지배하던 막번체제(幕藩?制)를 대신하여 단일한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전국을 지배하는 국가체제의 형성과정을 추적 해명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이 국가체제를 편의상 태정관제(太政官制)라 부른다. 근대 일본의 국가체제 형성과정에서 ‘태정관’이라는 용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1868년 7월 8일 직원령(職員令)에서 신기관(神祇官)과 함께 설치된 최고 행정기구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1867년 12월 9일 왕정복고(王政復古) 대호령 이후 1885년 12월 22일 내각제가 설치될 때까지 18년간 존재한 중앙정부를 통칭한다. 본서는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체제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후자의 의미로 태정관을 사용한다.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체제」는 왕정복고부터 자유민권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의 국가체제를 분석하면서 자유민권운동은 그동안 국가체제 구상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던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구상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역사상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설명한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이 왕정복고 이래 새로운 국가체제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 공유해 오던 사족 출신의 정부 요인들이 정한론 정변으로 중앙정부를 떠난 직후에 제출한 ‘민선의원설립건백서’였다는 점은 자유민권운동이 지니는 태생적 한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권운동 이전에 어떠한 국가체제 구상이 논의되었는지 파악하는 이 책의 사명과도 같은 작업은 그토록 전국적으로 자유‘민권’운동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근대 일본의 국가체제가 ‘국민’의 권리를 천황이 부여하는 ‘신민’의 권리로 규정하는 ‘대일본제국헌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초적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1867년 왕정복고에서 1871년 폐번치현까지의 국가체제, 즉 부번현 공존체제의 실태를 분석했고, 제2부에서는 1871년 폐번치현부터 1874년 ‘민선의원설립건백서’ 제출에 이르는 시기, 즉 아직 자유민권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단계의 국가체제 구상을 분석했다. 제1부와 제2부가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체제가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분석하고 있는 반면, 제3부는 시스템적으로 구체화되어가는 국가체제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와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근대 일본의 국가체제 형성과정에서 폐번치현은 획기적인 사건으로, 폐번치현 이전에는 천황과 인민이 각 번을 매개로 관계를 맺고 있어 부번현 공존체제의 운영이 국가체제 구상의 화두였으나 각번이 폐지된 폐번치현 이후에는 천황과 인민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국가체제 구상의 화두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규명하는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체제」는 근대 일본의 국가체제 분석에 있어서, 특히 자유민권운동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리라 예상된다. 또한 폐번치현 이후의 일본 근대 국가체제는 이후 우리 역사와 적잖은 관련을 맺으므로 근대 한일 양국의 관계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책이 될 것이다.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체제-지방관회의ㆍ태정관ㆍ천황」(이후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체제」)은 2003년 코베대학에서 발표된 논문 「일본 근대 국가 형성과 태정관제」와 이후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발표된 논문들을 촘촘하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막부와 각 번주(藩主)가 각각의 영지를 개별적으로 지배하던 막번체제(幕藩?制)를 대신하여 단일한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전국을 지배하는 국가체제의 형성과정을 추적 해명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이 국가체제를 편의상 태정관제(太政官制)라 부른다. 근대 일본의 국가체제 형성과정에서 ‘태정관’이라는 용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1868년 7월 8일 직원령(職員令)에서 신기관(神祇官)과 함께 설치된 최고 행정기구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1867년 12월 9일 왕정복고(王政復古) 대호령 이후 1885년 12월 22일 내각제가 설치될 때까지 18년간 존재한 중앙정부를 통칭한다. 본서는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체제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후자의 의미로 태정관을 사용한다.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체제」는 왕정복고부터 자유민권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의 국가체제를 분석하면서 자유민권운동은 그동안 국가체제 구상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던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구상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역사상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설명한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이 왕정복고 이래 새로운 국가체제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 공유해 오던 사족 출신의 정부 요인들이 정한론 정변으로 중앙정부를 떠난 직후에 제출한 ‘민선의원설립건백서’였다는 점은 자유민권운동이 지니는 태생적 한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권운동 이전에 어떠한 국가체제 구상이 논의되었는지 파악하는 이 책의 사명과도 같은 작업은 그토록 전국적으로 자유‘민권’운동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근대 일본의 국가체제가 ‘국민’의 권리를 천황이 부여하는 ‘신민’의 권리로 규정하는 ‘대일본제국헌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초적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1867년 왕정복고에서 1871년 폐번치현까지의 국가체제, 즉 부번현 공존체제의 실태를 분석했고, 제2부에서는 1871년 폐번치현부터 1874년 ‘민선의원설립건백서’ 제출에 이르는 시기, 즉 아직 자유민권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단계의 국가체제 구상을 분석했다. 제1부와 제2부가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체제가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분석하고 있는 반면, 제3부는 시스템적으로 구체화되어가는 국가체제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와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근대 일본의 국가체제 형성과정에서 폐번치현은 획기적인 사건으로, 폐번치현 이전에는 천황과 인민이 각 번을 매개로 관계를 맺고 있어 부번현 공존체제의 운영이 국가체제 구상의 화두였으나 각번이 폐지된 폐번치현 이후에는 천황과 인민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국가체제 구상의 화두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규명하는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체제」는 근대 일본의 국가체제 분석에 있어서, 특히 자유민권운동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리라 예상된다. 또한 폐번치현 이후의 일본 근대 국가체제는 이후 우리 역사와 적잖은 관련을 맺으므로 근대 한일 양국의 관계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책이 될 것이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책을 내면서
제1부 왕정복고와 국가체제
제1장_ 직할부현直轄府?의 ‘민정民政’과 지방관회의
1869년 교토부京都府회의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봉행소奉行所 지배에서 직할부 관할로
1) 교토·오사카 봉행소의 지배권과 지역 ‘민정’
2) 재판소의 지배권과 지역 ‘민정’
3. 메이지 초년 지역 ‘민정’의 전개와 교토부회의
4. 나오며
제2장_ 부번현 공존체제의 지방관할기구
민부(관)성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민부관 설치과정
3. 히로사와 사네오미의 ‘직제변혁반대 의견서’
4. 민부성과 대장성의 분리 문제
5. 나오며
제3장_ 부번현 공존체제 시기의 지방관 인사변천
1. 들어가며
2. 공가公家 출신 지방관
3. 번사藩士 출신 지방관
1) 정체서政體書 시기의 번사 출신 지방관
2) 직원령職員令 시기의 번사 출신 지방관
4. 나오며
제2부 폐번치현과 국가체제
제1장_ 폐번치현 직후의 태정관과 지방통치
1872년 천황지방순행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1872년 ‘전국요지순행건의’
3. 1872년 순행의 준비 및 실시
1) 태정관의 순행 준비 및 실시
2) 순행 실시과정-쿠마모토현熊本?의 경우
4. 사이고 타카모리의 ‘삼번임행론’
5. 나오며
제2장_ 폐번치현과 지방관회의 논쟁
1. 들어가며
2. 1872년 좌원의 지방관회의 실시론
3. 1873년 대장성의 지방관회동
4. 나오며
제3장_ 1874년 지방관회의 준비와 좌원左院의 역할
1. 들어가며
2. 1873년 태정관윤식과 좌원
1) 미야지마 세이치로의 좌원개정안
2) 정한론 정변 직후의 정체개혁과 좌원강화론
3. 1874년 지방관회의의 준비
4. 나오며
제3부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사상
제1장_ 메이지초년의 국체론
교도직의 3조교칙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교도직의 성격
3. 교도직의 국체론
1) 불교 측의 논리
2) 신도 측의 논리
4. 나오며
제2장_ 카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국가사상
1. 들어가며
2. 막부말기의 국가사상
3. 왕정복고 이후의 국가사상
1) 의사체제취조소 활동
2) 국법회의 참석과 메이지천황 교육
4. 폐번치현 이후의 국가사상
1) ‘민선의원설립건백서’와 「국체신론」-국체와 정체의 분리
2) 메이지 14년 정변과 「인권신설」
5. 나오며-대일본제국헌법의 국가사상에 대한 전망
[보론]_ 근대 일본 ‘국체’ 관념의 시각화
도쿄부 양정관 ‘국사회화’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근대 일본의 ‘국체’ 관념
1) 제국헌법의 ‘국체’ 관념
2) 교육칙어의 ‘국체’ 관념
3) 타이쇼·쇼와초기의 ‘국체’ 관념
3. 도쿄부 양정관의 ‘국사회화’
1) 양정관의 설립배경
2) ‘국체’ 관념의 시각화
① 메이지유신 이후의 ‘국사회화’
② 메이지유신 이전의 ‘국사회화’
4. 나오며
:: 후기
:: 논문 출전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제1부 왕정복고와 국가체제
제1장_ 직할부현直轄府?의 ‘민정民政’과 지방관회의
1869년 교토부京都府회의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봉행소奉行所 지배에서 직할부 관할로
1) 교토·오사카 봉행소의 지배권과 지역 ‘민정’
2) 재판소의 지배권과 지역 ‘민정’
3. 메이지 초년 지역 ‘민정’의 전개와 교토부회의
4. 나오며
제2장_ 부번현 공존체제의 지방관할기구
민부(관)성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민부관 설치과정
3. 히로사와 사네오미의 ‘직제변혁반대 의견서’
4. 민부성과 대장성의 분리 문제
5. 나오며
제3장_ 부번현 공존체제 시기의 지방관 인사변천
1. 들어가며
2. 공가公家 출신 지방관
3. 번사藩士 출신 지방관
1) 정체서政體書 시기의 번사 출신 지방관
2) 직원령職員令 시기의 번사 출신 지방관
4. 나오며
제2부 폐번치현과 국가체제
제1장_ 폐번치현 직후의 태정관과 지방통치
1872년 천황지방순행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1872년 ‘전국요지순행건의’
3. 1872년 순행의 준비 및 실시
1) 태정관의 순행 준비 및 실시
2) 순행 실시과정-쿠마모토현熊本?의 경우
4. 사이고 타카모리의 ‘삼번임행론’
5. 나오며
제2장_ 폐번치현과 지방관회의 논쟁
1. 들어가며
2. 1872년 좌원의 지방관회의 실시론
3. 1873년 대장성의 지방관회동
4. 나오며
제3장_ 1874년 지방관회의 준비와 좌원左院의 역할
1. 들어가며
2. 1873년 태정관윤식과 좌원
1) 미야지마 세이치로의 좌원개정안
2) 정한론 정변 직후의 정체개혁과 좌원강화론
3. 1874년 지방관회의의 준비
4. 나오며
제3부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사상
제1장_ 메이지초년의 국체론
교도직의 3조교칙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교도직의 성격
3. 교도직의 국체론
1) 불교 측의 논리
2) 신도 측의 논리
4. 나오며
제2장_ 카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국가사상
1. 들어가며
2. 막부말기의 국가사상
3. 왕정복고 이후의 국가사상
1) 의사체제취조소 활동
2) 국법회의 참석과 메이지천황 교육
4. 폐번치현 이후의 국가사상
1) ‘민선의원설립건백서’와 「국체신론」-국체와 정체의 분리
2) 메이지 14년 정변과 「인권신설」
5. 나오며-대일본제국헌법의 국가사상에 대한 전망
[보론]_ 근대 일본 ‘국체’ 관념의 시각화
도쿄부 양정관 ‘국사회화’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근대 일본의 ‘국체’ 관념
1) 제국헌법의 ‘국체’ 관념
2) 교육칙어의 ‘국체’ 관념
3) 타이쇼·쇼와초기의 ‘국체’ 관념
3. 도쿄부 양정관의 ‘국사회화’
1) 양정관의 설립배경
2) ‘국체’ 관념의 시각화
① 메이지유신 이후의 ‘국사회화’
② 메이지유신 이전의 ‘국사회화’
4. 나오며
:: 후기
:: 논문 출전
:: 참고문헌
:: 찾아보기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