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검색
본문
Powered by NAVER OpenAP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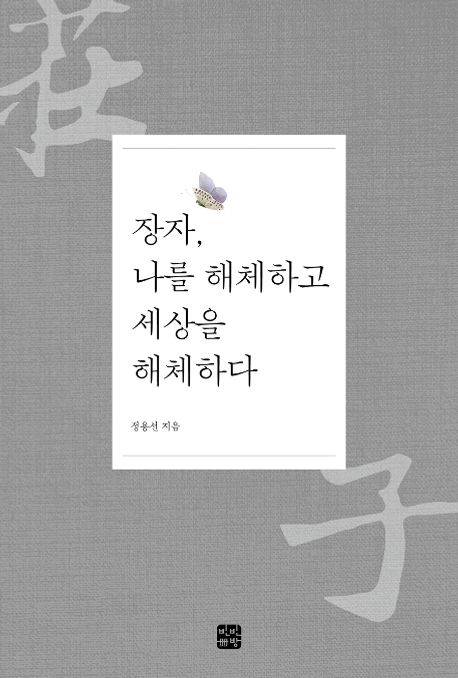
-
장자, 나를 해체하고 세상을 해체하다
저자 : 정용선
출판사 : 빈빈책방
출판년 : 2019
ISBN : 9791190105040
책소개
이 책은 장자莊子의 철학을 ‘형이상학적인 실체론적 사유의 해체를 통한 마음의 실용’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하기 위한 시도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장자의 사유를 '부정의 소극적 사유' 혹은 '현실도피적인 초월적 사유'가 아닌 '부정의 부정을 통한 세계 긍정의 활달하고 적극적인 사유'로 통찰하고자 한다.
목차
내 인생 최고의 스승, 고 김형효 선생님을 추도하며 4
다시 쓰는 서문 14
추천사 17
들어가는 말 19
서론 27
제1부│장자의 해체적 사유 51
1장 · 장자의 중심 문제 52
1절│문제의 내원(來源)과 문제의 해소: 성심과 허심 52
2절│좌망 이야기: 성심의 해체와 허심 60
1. 해체와 실용: 좌망을 통한 동어대통의 우주적 유대 회복 60
2. 「망인의」·「망예악」 61
3. 좌망과 동어대통 69
4. 동어대통의 연속적 유대와 「물고기 이야기」 71
2장 · 세계에 대한 장자의 해체적 시각 74
1절│세계에 대한 실체적 사유의 해체 77
1. 고정적인 실체성이 없는 세계: 대괴 77
2. 탈중심·무정형·무목적·무인과적인 실체성 없는 세계: 혼돈 82
3. 세계와 마음의 연속성 86
2절│자아의 실체성 해체 89
1. 자아의 역설 89
2. 꿈: 「나비의 꿈」과 「장오자의 꿈 이야기」 95
3절│장자의 언어 해체 99
1. 언어의 한계 99
2. 장자 언어관의 이중성 103
3. 언어적 매개를 넘어서: 대안으로서의 지인의 미러링(mirroring) 108
3장 · 장자의 언어적 수사 112
1절│우언·중언·치언 112
2절│은유 115
3절│초과적 어법에 대한 장자의 변론: 「견오와 연숙의 이야기」 117
제2부│『장자』 「내편」 : 텍스트 속으로 127
1장 · 『장자』 사유의 오리엔테이션: 소요유 128
1절│사유 여정의 지도 - 도지경: 대붕의 남행 133
2절│도지경의 허들: 지적 용렬과 지적 교만 136
3절│도지경의 이정표 141
1. 소지에 갇힌 마음: 메추라기 141
2. 대지에 갇힌 마음: 송영자 142
3. ‘변화’에 의지하는(所待) 마음: 열자 144
4. 무기·무공·무명: 지인(신인·성인) 146
4절│해체를 위한 시각의 전환 149
1. 자연 세계(無爲)와 인간 세계(有爲)에 대한 이분법 해체: 요와 허유 이야기 149
2. 고정된 시각(有蓬之心)의 해체에서 얻는 실용성: 손 연고 이야기 154
3. 무용과 무하유지향: 「혜시의 무용한 나무 이야기」 158
2장 · 『장자』의 해체: 제물론 161
1절│제물의 평등: 동일성과 차이, 그리고 상존 164
1. 제물에 관한 논의 164
2. 각 개별자의 시각에서 진리가 현현하는 제물의 세계 166
3. 상존의 구체적 양식: 행위의 해체(無爲)·욕망의 해체(無欲)·앎의 해체(無知) 168
2절│상아에서 현현하는 존재의 실상: 「천뢰 이야기」 169
1. 오상아와 천뢰 169
2. 피차와 시비의 해체: 도추와 이명 176
3. 천균과 양행: 지의 한계와 「조삼모사 이야기」 185
3절│제물의 일(一)과 획일의 일(一) 190
1. ‘명지’ 불가능성: 「소문·사광·혜시 이야기」 191
2. 제일과 획일: 요와 열 개의 해 이야기 194
4절│진리는 확정할 수 없고, 보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196
1. 세계의 시원 및 통일성에 대한 거대 담론의 불가능성 196
2. 보편자는 존재하는가: 설결과 왕예의 이야기 199
3. 무한한 창조성의 보고: 천부와 보광 203
5절│상온과 상존, 그리고 천예: 「장오자와 구작자의 이야기」 207
1. 얽혀 있는 세계와 개별자간의 상호 존중: 상온과 상존 207
2. 천예와 만연, 그리고 자정 209
3장 · 해체의 실용: 현해와 양생 215
1절│현해: 해체와 문제의 해소 217
1. 불행과의 조우: 우사의 외발 217
2. 죽음과의 조우: 노담의 죽음 219
2절│양생의 길(방법): 실상과 조우하는 포정의 해우술 225
4장 · 해체와 인간의 역사 세계: 인간세 231
1절│세상을 구하려는 것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 233
1. 익다: 세상을 구하려는 「안회 이야기」 233
2. 심재: 허심을 향한 공부 239
3. 인간세의 천균: 부득이와 양중 244
2절│인간 역사 세계의 부득이한 참여 248
1. 피할 수 없는 역사 세계의 임무에 대하여: 섭공 이야기 249
2. 무도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안합의 이야기 256
3절│인간 역사 세계의 유용지무용과 무용지대용 260
1. 무용의 전생: 산목과 대목 이야기 261
2. 육체적 무용: 지리소 이야기 266
3. 덕의 지리: 광인 접여 이야기 268
5장 · 해체의 덕(무용의 덕): 덕충부 271
1절│불구 무용의 덕 274
1. 미러링(mirroring)의 덕: 왕태 이야기 274
2. 화이불창하는 재전의 덕: 애태타 이야기 278
3. 재전이덕불형의 덕: 인기지리무신과 옹앙대영의 덕 285
2절│유형의 덕이 갖는 부덕 291
1. 예?의 사정권에 있는 유용자의 덕: 정자산과 신도가 이야기 291
2. 인의의 질곡에 갇힌 공자의 덕: 숙산무지와 공자 이야기 296
3절│지인은 정이 없는가: 장자와 혜시의 논변 300
1. 무정이란 익생하지 않는 것 300
2. 익생과 견백의 궤변 304
3. 혜시의 「천지일체」와 장자의 「제물」의 차이 307
6장 · 존재의 실상에 대한 참된 앎, 진인: 대종사 313
1절│인식(知)의 한계와 참된 앎, 진지 315
1. 인식(知)의 한계 315
2. 진인의 참된 앎, 진지 318
3. 진인의 덕: 천인불상승 321
2절│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 과정의 실상 328
1. 인력이 개입될 수 없는 자연 과정, 명: 자상 이야기 328
2. 도의 실상과 도를 얻은 자들 332
3절│도는 배울 수 있는 것인가. 337
1. 영녕: 남백자규와 여우 이야기 338
2. 도는 어떻게 전해지는가 342
4절│대종사라 부를 만한 사람들: 진인들 이야기 345
1. 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진인: 자사와 친구들 이야기 347
2. 물화에 감탄하는 진인: 자래의 병 350
3. 방외지사: 자상호와 친구들 353
4. 맹손재의 치상: 행적은 방내에 마음은 방외에 361
7장 · 해체한 마음의 ‘제왕같은’ 자유로움: 응제왕 366
1절│진지는 불지, 판단하지 않는 마음의 자유: 설결과 왕예 이야기 368
2절│자유로운 제왕의 마음 371
1. 의인화된 무용지용의 자유: 광접여 371
2. 무하유지향에서 노니는 자유인: 무명인 373
3. 무방한 명왕의 자유: 노담과 양자거의 대화 376
3절│의인화된 도: 호자의 신묘불측 380
1. 호자와 계함의 이야기 382
2. 구도를 위한 열자의 공부 389
3. 허심(mirroring)을 위한 공부의 조목과 허심의 실용: 승물이불상 391
4. 혼돈칠규: ‘제왕 같은 자유로운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394
결론 401
참고문헌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