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검색
본문
Powered by NAVER OpenAP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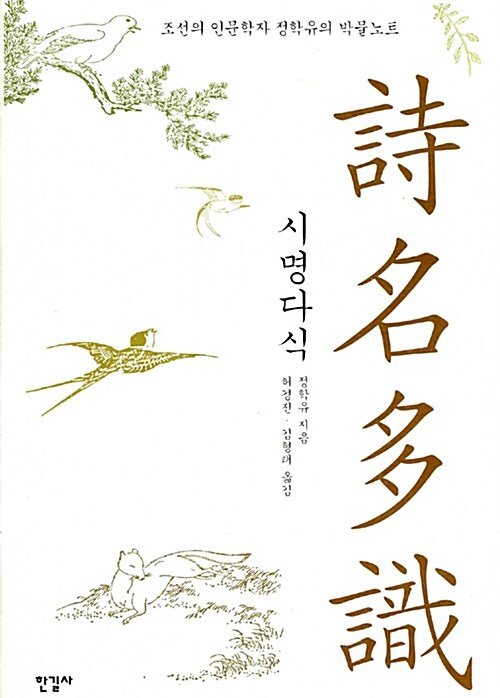
-
시명다식
저자 : 정학유
출판사 : 한길사
출판년 : 2007
ISBN : 9788935658510
책소개
『시명다식』은 정약용의 둘째 아들이자 「농가월령가」의 작가로 알려진 정학유의 저술로,『시경』에 등장하는 생물의 이름을 고증하여 해설한 이른바 '생물백과사전'이다. 『시경』에 등장하는 생물을 고증한 서적은 중국 및 일본에서 기존에도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시명다식』이 유일하다. 해당 시의 원문과 번역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각 항목마다 물명의 이해를 돕고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해주는 삽화를 수록하여 생김새와 그 생태를 함께 찾아볼 수 있는 백과사전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스24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고사리, 냉이, 쑥, 갈대, 칡, 물억새……, 우리는 당연하게 식물과 그 이름을 연결지어 부른다. 하지만 그 이름이 붙기 전에는 고사리는 아직 고사리가 아닌 단지 ‘풀’일 뿐이었다. 아무도 신경쓰지 않던 ‘풀’들이 하나하나 제 특색을 내보이며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바로 작은 차이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그 생태와 습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려는 경향이 생기면서부터였다. 그런 변화의 결실로 맺어진 저작이 바로 이번에 처음으로 번역ㆍ출판된 『시명다식』(詩名多識)이다.
1. 『시명다식』은 어떤 책인가?
조선의 인문학자 정학유의 생물백과사전
『시명다식』은 정약용의 둘째 아들이자 「농가월령가」의 작가로 알려진 정학유의 저술로,『시경』?에 등장하는 생물의 이름을 고증하여 해설한 책이다. 『시경』에 등장하는 생물을 고증한 서적은 중국 및 일본에서 기존에도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시명다식』이 유일하다. 그 존재는 오래 전부터 연구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정약용의 장남 정학연의 시집 『삼창관집』(三倉館集)이 일본 궁내청서릉부(宮內廳書陵部)에서 발견되면서 더불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시명다식』은 서울대학교 규장각본, 동경대학교 소창문고본, 버클리대학교 아사미문고본 등 세 가지 판본이 존재한다. 그중 번역의 저본으로 사용한 서울대학교 규장각본은 빠진 부분이 없이 내용이 충실하고 필사상태가 정연하여 선본(善本)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과 미국에도 『시명다식』의 이본이 존재하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의 저술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까지 그 서명이 알려져 있었다는 점은 이 책이 당대에 유명했던 가치 있는 저술임을 증명하고 있다.
『시경』 속의 생물을 해설하는 책
『시명다식』에서는 『시경』에 등장하는 생물을 풀, 곡식, 나무, 채소, 새, 들짐승, 물고기, 벌레의 8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각 항목의 생물 이름에 이어서 그 생물이 등장하는 『시경』의 해당 장의 편명을 적고, 주희(朱熹)의 『시전』(詩傳), 육기(陸璣)의 『모시초목조수충어소』(毛詩草木鳥獸蟲魚疏),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 등 다양한 문헌을 인용하고 검토하여 설명을 붙였다. 『시명다식』은 전체 4권 2책, 「식초」(識草), 「식곡」(識穀), 「식목」(識木), 「식채」(識菜), 「식조」(識鳥), 「식수」(識獸), 「식충」(識蟲), 「식어」(識魚)의 총 8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항목의 수는 326항목이 이른다.
우리 시가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
『시경』은 오래 전부터 우리 시가문학에 풍부한 영감을 불어넣어 왔다. 그 활용은 주로 인용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가사나 한시 갈래 등에 활용된 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따라서 『시경』이 인용된 우리 문학작품의 경우, 올바른 독법 및 해석을 위해 『시경』의 문구나 물명(物名)에 대한 의미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시명다식』은 중국의 『시경』을 해설하는 저작에 그치지 않고, 우리 고전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도 빼놓을 수 없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2. 『시명다식』의 학문적 성과
실학사상에 바탕을 둔 실용적인 저술
정학유가 살았던 18세기의 조선은 실학의 시대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 당시 지배계급의 학문이던 성리학이 점차 현실에서 멀어지고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을 비판하며 일어난 실학사상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 증명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실제 생활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시명다식』과 같은 백과사전식 저술은 실학의 대표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정학유의 아버지 다산 정약용은 실학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실학자였으며, 멀리 유배지에서도 자주 편지를 보내 실천과 학술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선비 본연의 자세임을 강조하였다. 정학유는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시명다식』을 저술하면서 고증을 중시하고, 이를 현실과 접목시키려 하였다.
철저한 고증 추구
『시명다식』에서는 참고문헌을 인용하고 설명을 진행하는 방식이 매우 정연하다. 다양한 문헌을 참고도서로 인용하면서 모든 항목에서 그 출처를 확실히 하여 철저한 고증을 추구하였다. 참고 문헌을 인용할 때도 문헌의 성격을 고려하여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여러 책에서 서로 엇갈리는 설명이 있을 때는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을 택했으며, 그에 대해서는 자신의 보충 설명을 통해 지적하여 기술에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불명확했던 대상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혀내고자 한 것이다.
실용성 강조
『시명다식』과 비슷한 종류의 『시경』 관련 훈고서에서는 대개 식물의 분류를 「식초」(識草)와 「식목」(識木)의 두 갈래로 나누고 있으나 『시명다식』에서는 「식초」(識草), 「식곡」(識穀), 「식목」(識木), 「식채(識菜)」로 세분화하여 나누었다. 이는 더욱 철저하고 세밀한 고증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며, 동시에 곡식과 채소 등 식용의 여부를 중시하여 식물을 분류함으로써, 더욱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다. 또한 ‘용’(龍)과 같은 비현실적인 생물은 과감하게 설명을 생략하고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동식물의 설명이 특히 자세하다. 이 같은 점에서 이 책의 실용적 측면을 부각시키려 한 저자의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
3. 『시명다식』 번역판의 특징
시의 원문과 번역 수록
『시명다식』 원본에서는 각 물명이 등장하는 『시경』의 편명만을 밝혀 적었으나 번역판 『시명다식』에서는 해당 시의 원문과 번역을 함께 수록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시경』의 시 안에서 동식물명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시경』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은 물론, 국문학 전공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다.
삽화 수록으로 완전한 백과사전식 구성
또한 각 항목마다 수록된 삽화는 물명의 이해를 돕고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사고전서』 등에 실려 있는 서정(徐鼎)의 『모시명물도설』(毛詩名物圖說), 『이아도』(爾雅圖)와 연재관(淵在寬)의 『육씨초목조수충어소도해』(陸氏草木鳥獸蟲魚疏圖解), 강원봉(岡元鳳)의 『모시품물도고』(毛詩品物圖攷) 등 중국과 일본의 『시경』 해석서에 사용된 삽화들을 가려 뽑아 『시명다식』의 항목에 맞게 수록하였다. 생김새와 그 생태를 함께 찾아볼 수 있는 명실상부한 백과사전식 구성으로 완성되었다.
고전의 느낌을 살리는 우아한 장정
내용만이 아니라 겉모습에서도 독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애썼다. 천으로 싼 고급스럽고 견고한 양장 제본에 더해 한지 촉감의 커버로 고전의 느낌을 살리도록 했다. 동양화의 느낌이 나는 삽화에 잘 어울리는 은은한 색깔의 2색 인쇄와 본문 디자인은 책에 품격을 더한다. 국문학 연구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이 책과 함께라면 고전의 향기에 흠뻑 취할 수 있을 것이다.
1. 『시명다식』은 어떤 책인가?
조선의 인문학자 정학유의 생물백과사전
『시명다식』은 정약용의 둘째 아들이자 「농가월령가」의 작가로 알려진 정학유의 저술로,『시경』?에 등장하는 생물의 이름을 고증하여 해설한 책이다. 『시경』에 등장하는 생물을 고증한 서적은 중국 및 일본에서 기존에도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시명다식』이 유일하다. 그 존재는 오래 전부터 연구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정약용의 장남 정학연의 시집 『삼창관집』(三倉館集)이 일본 궁내청서릉부(宮內廳書陵部)에서 발견되면서 더불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시명다식』은 서울대학교 규장각본, 동경대학교 소창문고본, 버클리대학교 아사미문고본 등 세 가지 판본이 존재한다. 그중 번역의 저본으로 사용한 서울대학교 규장각본은 빠진 부분이 없이 내용이 충실하고 필사상태가 정연하여 선본(善本)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과 미국에도 『시명다식』의 이본이 존재하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의 저술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까지 그 서명이 알려져 있었다는 점은 이 책이 당대에 유명했던 가치 있는 저술임을 증명하고 있다.
『시경』 속의 생물을 해설하는 책
『시명다식』에서는 『시경』에 등장하는 생물을 풀, 곡식, 나무, 채소, 새, 들짐승, 물고기, 벌레의 8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각 항목의 생물 이름에 이어서 그 생물이 등장하는 『시경』의 해당 장의 편명을 적고, 주희(朱熹)의 『시전』(詩傳), 육기(陸璣)의 『모시초목조수충어소』(毛詩草木鳥獸蟲魚疏),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 등 다양한 문헌을 인용하고 검토하여 설명을 붙였다. 『시명다식』은 전체 4권 2책, 「식초」(識草), 「식곡」(識穀), 「식목」(識木), 「식채」(識菜), 「식조」(識鳥), 「식수」(識獸), 「식충」(識蟲), 「식어」(識魚)의 총 8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항목의 수는 326항목이 이른다.
우리 시가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
『시경』은 오래 전부터 우리 시가문학에 풍부한 영감을 불어넣어 왔다. 그 활용은 주로 인용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가사나 한시 갈래 등에 활용된 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따라서 『시경』이 인용된 우리 문학작품의 경우, 올바른 독법 및 해석을 위해 『시경』의 문구나 물명(物名)에 대한 의미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시명다식』은 중국의 『시경』을 해설하는 저작에 그치지 않고, 우리 고전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도 빼놓을 수 없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2. 『시명다식』의 학문적 성과
실학사상에 바탕을 둔 실용적인 저술
정학유가 살았던 18세기의 조선은 실학의 시대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 당시 지배계급의 학문이던 성리학이 점차 현실에서 멀어지고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을 비판하며 일어난 실학사상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 증명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실제 생활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시명다식』과 같은 백과사전식 저술은 실학의 대표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정학유의 아버지 다산 정약용은 실학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실학자였으며, 멀리 유배지에서도 자주 편지를 보내 실천과 학술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선비 본연의 자세임을 강조하였다. 정학유는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시명다식』을 저술하면서 고증을 중시하고, 이를 현실과 접목시키려 하였다.
철저한 고증 추구
『시명다식』에서는 참고문헌을 인용하고 설명을 진행하는 방식이 매우 정연하다. 다양한 문헌을 참고도서로 인용하면서 모든 항목에서 그 출처를 확실히 하여 철저한 고증을 추구하였다. 참고 문헌을 인용할 때도 문헌의 성격을 고려하여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여러 책에서 서로 엇갈리는 설명이 있을 때는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을 택했으며, 그에 대해서는 자신의 보충 설명을 통해 지적하여 기술에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불명확했던 대상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혀내고자 한 것이다.
실용성 강조
『시명다식』과 비슷한 종류의 『시경』 관련 훈고서에서는 대개 식물의 분류를 「식초」(識草)와 「식목」(識木)의 두 갈래로 나누고 있으나 『시명다식』에서는 「식초」(識草), 「식곡」(識穀), 「식목」(識木), 「식채(識菜)」로 세분화하여 나누었다. 이는 더욱 철저하고 세밀한 고증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며, 동시에 곡식과 채소 등 식용의 여부를 중시하여 식물을 분류함으로써, 더욱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다. 또한 ‘용’(龍)과 같은 비현실적인 생물은 과감하게 설명을 생략하고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동식물의 설명이 특히 자세하다. 이 같은 점에서 이 책의 실용적 측면을 부각시키려 한 저자의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
3. 『시명다식』 번역판의 특징
시의 원문과 번역 수록
『시명다식』 원본에서는 각 물명이 등장하는 『시경』의 편명만을 밝혀 적었으나 번역판 『시명다식』에서는 해당 시의 원문과 번역을 함께 수록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시경』의 시 안에서 동식물명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시경』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은 물론, 국문학 전공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다.
삽화 수록으로 완전한 백과사전식 구성
또한 각 항목마다 수록된 삽화는 물명의 이해를 돕고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사고전서』 등에 실려 있는 서정(徐鼎)의 『모시명물도설』(毛詩名物圖說), 『이아도』(爾雅圖)와 연재관(淵在寬)의 『육씨초목조수충어소도해』(陸氏草木鳥獸蟲魚疏圖解), 강원봉(岡元鳳)의 『모시품물도고』(毛詩品物圖攷) 등 중국과 일본의 『시경』 해석서에 사용된 삽화들을 가려 뽑아 『시명다식』의 항목에 맞게 수록하였다. 생김새와 그 생태를 함께 찾아볼 수 있는 명실상부한 백과사전식 구성으로 완성되었다.
고전의 느낌을 살리는 우아한 장정
내용만이 아니라 겉모습에서도 독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애썼다. 천으로 싼 고급스럽고 견고한 양장 제본에 더해 한지 촉감의 커버로 고전의 느낌을 살리도록 했다. 동양화의 느낌이 나는 삽화에 잘 어울리는 은은한 색깔의 2색 인쇄와 본문 디자인은 책에 품격을 더한다. 국문학 연구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이 책과 함께라면 고전의 향기에 흠뻑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예스24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머리말 | 『시경』을 통해 자연을 탐구한 조선 인문학자의 생물백과사전을 만나다
서문
제1권 식초(識草)
행채荇菜 ㆍ 노랑어리연꽃 외 77항목
제1권 식곡(識穀)
맥 ㆍ 보리 외 19항목
제2권 식목(識木)
도 ㆍ 복숭아나무 외 61항목
제2궈너 식채(識菜)
포_ㆍ 박 외 9항목
제3권 식조(識鳥)
저구 ㆍ 물수리 외 43항목
제3권 식수(識獸)
마 ㆍ 말 외 62항목
제4권 식충(識蟲)
종사 ㆍ 여치 외 29항목
제4권 식어(識魚)
방_ㆍ 방어 18항목
발문
해제 | 조선 후기 옹골진 인문학자의 생물학적 연구 성과
인용 인명
인용 서명
찾아보기
서문
제1권 식초(識草)
행채荇菜 ㆍ 노랑어리연꽃 외 77항목
제1권 식곡(識穀)
맥 ㆍ 보리 외 19항목
제2권 식목(識木)
도 ㆍ 복숭아나무 외 61항목
제2궈너 식채(識菜)
포_ㆍ 박 외 9항목
제3권 식조(識鳥)
저구 ㆍ 물수리 외 43항목
제3권 식수(識獸)
마 ㆍ 말 외 62항목
제4권 식충(識蟲)
종사 ㆍ 여치 외 29항목
제4권 식어(識魚)
방_ㆍ 방어 18항목
발문
해제 | 조선 후기 옹골진 인문학자의 생물학적 연구 성과
인용 인명
인용 서명
찾아보기
[예스24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