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검색
본문
Powered by NAVER OpenAP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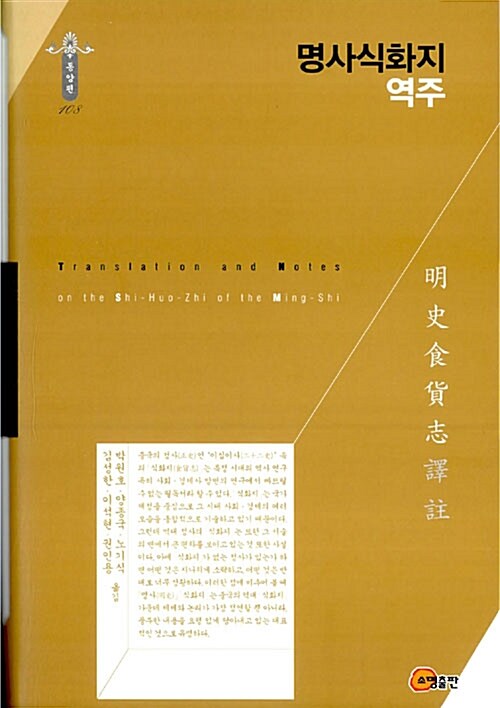
-
명사식화지 역주
저자 : 박원호외
출판사 : 소명출판
출판년 : 2008
ISBN : 9788956263526
책소개
중국의 정사인 '이십이사'속의 「식화지」는 특정 시대의 역사 연구 특히 사회.경제사 방면의 연구에서 빠뜨릴수 없는 필독서라 할 수 있다.「식화지」는 국가재정을 중심으로 그 시대 사회.경제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역대 정사의 「식화지」는 또한 그 서술의 면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아예 「식화지」가 없는 정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지나치게 소략하고,어떤 것은 반대로 너무 장황하다.
[예스24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식화지란 중국 역대 정사 중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다룬 역사문화의 객관적 기축이다.
중국의 역대 식화지 가운데 체제와 논리가 가장 정연한 식화지
중국의 정사(正史)인 ‘이십이사(二十二史)’ 속의 「식화지(食貨志)」는 특정 시대(이 책에서는 명대를 의미한다)-의 역사 연구 특히 사회․경제사 방면의 연구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필독서라 할 수 있다. 「식화지」는 국가재정을 중심으로 그 시대 사회․경제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대 정사의 「식화지」는 또한 그 서술의 면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예 「식화지」가 없는 정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지나치게 소략하고, 어떤 것은 반대로 너무 장황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사(明史)』 「식화지」는 중국의 역대 「식화지」 가운데 체제와 논리가 가장 정연할 뿐 아니라, 풍부한 내용을 요령 있게 담아내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다.
『명사』 자체가 중국의 여러 정사 가운데 가장 높이 평가받는 사서(史書)임은 잘 알려진 바이다. 청대(淸代)의 저명한 역사가인 조익(趙翼)은 『이십이사차기(二十二史箚記)』 권31 「명사(明史)」에서, “근대의 여러 역사서 가운데 『명사』와 같이 완벽한 것은 없었다. 대개 60여 년을 경과한 다음에 일을 끝냈으니, 옛부터 역사 편찬에 이처럼 시일이 오래 걸리고 깊이 공들인 적은 없었다. 또 강희(康熙) 연간에 편찬되어 전 왕조와 시간적으로 멀지 않으므로, 사적(事迹)의 근원과 결말이 진실을 많이 담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물론 편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관계로 기술에 중복되고 모순되는 등의 문제를 고려해볼 때 위 조익의 평가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명사』는 뚜렷한 장점을 갖고 있다. 우선 편찬 참여자들이 만사동(萬斯同)을 비롯한 당대의 저명한 학자들이었다. 또 편찬 기간도 역대의 정사 가운데 가장 길었으며, 세 차례의 정정을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원고를 확정하였다. 따라서 『명사』는 체제나 문장뿐 아니라 내용도 충실하여, ‘이십이사’ 가운데 가장 잘 편찬된 정사 가운데 하나라는 점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명사』는 이처럼 청조(淸朝) 고증학(考證學)의 전성기라는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일류의 학자가 수십 년 간에 걸쳐 편찬한 뛰어난 정사의 하나이지만, 「식화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백미(白眉)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군더더기를 없애고 짜임새 있게 서술하였을 뿐 아니라, 광범위한 관련 사료(史料)를 소화한 상태에서 논리적이고도 조리 있게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그 안에는 약간의 오해와 탈루(脫漏)도 없지 않지만, 그것이 『명사』 「식화지」의 가치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오류는 다행히 참고할 만한 사료가 많이 남아 있어 비교적 보정(補正)이 수월한 편이기도 하다.
모두 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명사』 「식화지」는 체제와 구성 면에서도 발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1권은 인정(人丁)과 세량(稅糧)의 전제인 호구(戶口)와 전제(田制)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전토(田土)와 정구(丁口)에서 나오는 부세(賦稅)와 요역(徭役)은 부역(賦役)으로 통합하여 2권을 이루었다. 정부에 보내기 위하여 이를 운반하고 축장(蓄藏)하는 내용의 조운(漕運)과 창고(倉庫)는 3권에서 서술되었다. 뒤를 이어 세량 외에 재정 수입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 염과(鹽課)와 차과(茶課)인 만큼 염법(鹽法)과 차법(茶法)은 4권에서 서술하였다. 5권에서는 전초(錢鈔)와 그 원료를 산출하는 갱야(坑冶), 그리고 그 전초를 거두는 상세(商稅)와 시박(市舶) 및 마시(馬市)를 기술하였다. 6권에서는 궁중어용(宮中御用)의 상공채조(上供採造)와 국가지출의 대종을 이루는 봉향(俸餉)을 서술한 다음 마지막으로 전세(田稅) 및 경비(經費)의 출납수(出納數)를 개괄한 회계(會計)를 실었다. 이처럼 『명사』 「식화지」는 그 서술의 순서와 구조가 짜임새가 있고 조리가 있다. 후에 『청사고(淸史稿)』 「식화지」가 이 체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중국의 역대 식화지 가운데 체제와 논리가 가장 정연한 식화지
중국의 정사(正史)인 ‘이십이사(二十二史)’ 속의 「식화지(食貨志)」는 특정 시대(이 책에서는 명대를 의미한다)-의 역사 연구 특히 사회․경제사 방면의 연구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필독서라 할 수 있다. 「식화지」는 국가재정을 중심으로 그 시대 사회․경제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대 정사의 「식화지」는 또한 그 서술의 면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예 「식화지」가 없는 정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지나치게 소략하고, 어떤 것은 반대로 너무 장황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사(明史)』 「식화지」는 중국의 역대 「식화지」 가운데 체제와 논리가 가장 정연할 뿐 아니라, 풍부한 내용을 요령 있게 담아내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다.
『명사』 자체가 중국의 여러 정사 가운데 가장 높이 평가받는 사서(史書)임은 잘 알려진 바이다. 청대(淸代)의 저명한 역사가인 조익(趙翼)은 『이십이사차기(二十二史箚記)』 권31 「명사(明史)」에서, “근대의 여러 역사서 가운데 『명사』와 같이 완벽한 것은 없었다. 대개 60여 년을 경과한 다음에 일을 끝냈으니, 옛부터 역사 편찬에 이처럼 시일이 오래 걸리고 깊이 공들인 적은 없었다. 또 강희(康熙) 연간에 편찬되어 전 왕조와 시간적으로 멀지 않으므로, 사적(事迹)의 근원과 결말이 진실을 많이 담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물론 편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관계로 기술에 중복되고 모순되는 등의 문제를 고려해볼 때 위 조익의 평가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명사』는 뚜렷한 장점을 갖고 있다. 우선 편찬 참여자들이 만사동(萬斯同)을 비롯한 당대의 저명한 학자들이었다. 또 편찬 기간도 역대의 정사 가운데 가장 길었으며, 세 차례의 정정을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원고를 확정하였다. 따라서 『명사』는 체제나 문장뿐 아니라 내용도 충실하여, ‘이십이사’ 가운데 가장 잘 편찬된 정사 가운데 하나라는 점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명사』는 이처럼 청조(淸朝) 고증학(考證學)의 전성기라는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일류의 학자가 수십 년 간에 걸쳐 편찬한 뛰어난 정사의 하나이지만, 「식화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백미(白眉)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군더더기를 없애고 짜임새 있게 서술하였을 뿐 아니라, 광범위한 관련 사료(史料)를 소화한 상태에서 논리적이고도 조리 있게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그 안에는 약간의 오해와 탈루(脫漏)도 없지 않지만, 그것이 『명사』 「식화지」의 가치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오류는 다행히 참고할 만한 사료가 많이 남아 있어 비교적 보정(補正)이 수월한 편이기도 하다.
모두 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명사』 「식화지」는 체제와 구성 면에서도 발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1권은 인정(人丁)과 세량(稅糧)의 전제인 호구(戶口)와 전제(田制)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전토(田土)와 정구(丁口)에서 나오는 부세(賦稅)와 요역(徭役)은 부역(賦役)으로 통합하여 2권을 이루었다. 정부에 보내기 위하여 이를 운반하고 축장(蓄藏)하는 내용의 조운(漕運)과 창고(倉庫)는 3권에서 서술되었다. 뒤를 이어 세량 외에 재정 수입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 염과(鹽課)와 차과(茶課)인 만큼 염법(鹽法)과 차법(茶法)은 4권에서 서술하였다. 5권에서는 전초(錢鈔)와 그 원료를 산출하는 갱야(坑冶), 그리고 그 전초를 거두는 상세(商稅)와 시박(市舶) 및 마시(馬市)를 기술하였다. 6권에서는 궁중어용(宮中御用)의 상공채조(上供採造)와 국가지출의 대종을 이루는 봉향(俸餉)을 서술한 다음 마지막으로 전세(田稅) 및 경비(經費)의 출납수(出納數)를 개괄한 회계(會計)를 실었다. 이처럼 『명사』 「식화지」는 그 서술의 순서와 구조가 짜임새가 있고 조리가 있다. 후에 『청사고(淸史稿)』 「식화지」가 이 체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권77 지53
食貨 1
戶口
田制
屯田
莊田
권78 지54
食貨 2
賦役
役法
권79 지55
食貨 3
漕運
倉庫
권80 지56
食貨 4
鹽法
茶法
권81 지57
食貨 5
錢?
坑冶 附 鐵冶 銅場
商稅
市舶
馬市
권82 지58
食貨 6
上供採造
採造
柴炭
採木
珠池
織造
燒造
俸餉
會計
食貨 1
戶口
田制
屯田
莊田
권78 지54
食貨 2
賦役
役法
권79 지55
食貨 3
漕運
倉庫
권80 지56
食貨 4
鹽法
茶法
권81 지57
食貨 5
錢?
坑冶 附 鐵冶 銅場
商稅
市舶
馬市
권82 지58
食貨 6
上供採造
採造
柴炭
採木
珠池
織造
燒造
俸餉
會計
[알라딘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